정신의학신문 ㅣ 황현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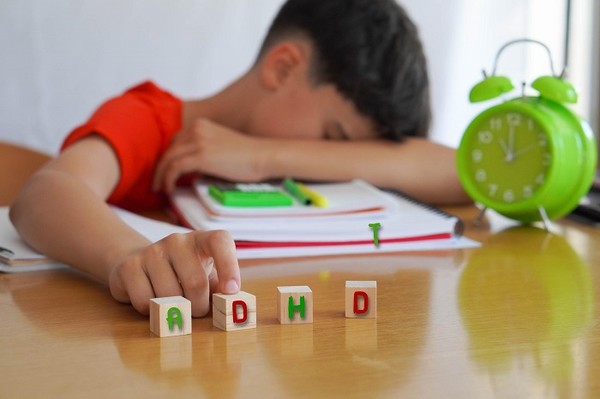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부모님들, 또는 자녀에 대한 고민으로 관련 글들을 검색하고 있을 부모님들의 지난 1년은 어떠셨나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ADHD 자녀를 양육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감정에 대한 배려 부족입니다.
ADHD 자녀는 주요증상인 집중력 부족, 과잉행동, 충동성 등으로 일상에서 실수하거나 행동 문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럴 때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부정적인 피드백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반복될 경우 자녀는 스스로를 부정적인 사람이라 인식하고 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자녀의 실수 또는 행동을 교정할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함께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실수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와 같은 격려는 자녀에게 가볍게 건네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노력하거나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를 인지하고 칭찬과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ADHD의 다양한 면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종종 ADHD 자녀가 주어진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쉽게 ‘게으르다’,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DHD로 인한 뇌의 기능적 특성 또는 작업기억 문제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대화 도중 말을 듣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일부러 저런다’, ‘또 반복되는 것을 보니 고의로 저러는 것이다’라는 생각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동성 증상으로 인해 대화를 차례대로 이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과잉행동이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ADHD는 단순한 집중력 부족 또는 충동성을 넘어선 뇌의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이기에, 이 장애의 다양한 면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치료의 필요성 맹신 또는 간과입니다.
종종 ADHD를 진단받은 자녀가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아 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는 진료 후 약을 처방 받았지만 ‘혹시 안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녀에게 약은 주지 않고 진료실에만 데려오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약물치료와 양육의 적절한 균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DHD의 치료에서 약물치료가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부모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환경과 적절한 양육 또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합니다. 진료실을 벗어나 보다 오랜 시간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상 및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제공하는 양육과 지원은 자녀가 ADHD를 치료하며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 자녀의 ADHD 증상이 반복될 경우 부모들은 쉬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자녀의 증상을 보며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우리 아이 힘들겠다. 저것은 ADHD의 증상의 일환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ADHD 자녀를 육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점들은 공유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요즘 ADHD에 대한 정보들은 여기저기에서 쉽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면 혹시 내 아이도 ADHD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ADHD의 진단 과정은 임상 면담, 행동관찰, 심리학적 평가, 부모 또는 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진료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ㅣ 황현찬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대한정신약물학회 평생회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과 세부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