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신문 :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번째 연재까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 중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왔다면?’이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을 바랐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포기하자. 그래도 아쉽다면 해상도를 높여 바라보고,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조각을 조금이나마 찾아보자.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바라지 마라.’가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앞 연재에서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흥미진진하고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6번째 연재부터는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약간의 ‘진화심리학’적 지식과 ‘뇌과학’적 지식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면서부터였거든요. 두 번째 이유의 배경에는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들려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가보려 합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자주 하고 있는 토론인데요. 간단한 상황이 주어지고, 간단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뉘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토론 내용부터 흥미진진하답니다.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흥미로울 수 있고요. 토론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왔다리갔다리 하거든요. 대신 어려운 내용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따라오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 수동적으로 읽는 것과 능동적으로 읽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꼭 빈칸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했던 실험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Random으로 나눈 A 그룹에는 ‘슬픈 영화’를 보여주었고요. 또 다른 B 그룹에는 그냥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컵 하나’를 들고 가서 ‘이 컵을 얼마 주고 사겠냐?’라고 물어본 것이 이 실험 내용의 모두입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이 실험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똑같은 컵인데도 불구하고, A 그룹과 B 그룹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난 A 그룹의 경우 ‘컵’을 평균 10달러에 사겠다고 반응한 데 비해,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난 B 그룹은 평균 2.5달러에 ‘똑같은’ 컵을 사겠다고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결과도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우리도 평소에 슬프고 공허한 감정을 느낄 때는 더 많이 먹거나, 더 많이 소비하면서 그 공허한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 실험을 시행한 과학자들의 해석도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난 A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 그룹은 컵을 평균 10달러에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10달러에 컵을 사겠다는 행위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10달러에 컵을 산 행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과학자일까요? 10달러를 낸 사람일까요?’가 그 질문입니다. 물론 제3의 의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을 정하셨으면 아래 빈칸에 한 번 적어보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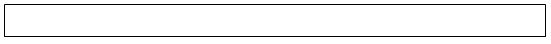
답을 정하셨으면 그렇게 답을 정한 이유 및 근거에 대해서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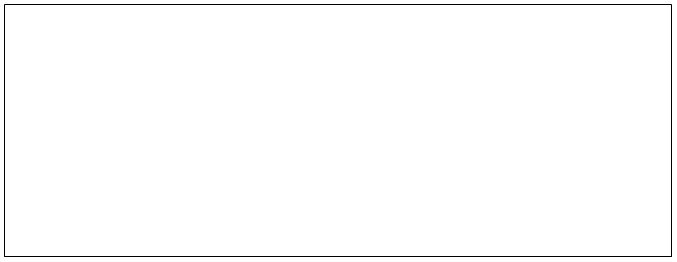
적어보시면서 생각 정리를 해보셨나요? 상황도 간단하고, 질문도 간단한데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10달러를 낸 사람’이 주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같다가도, ‘과학자’가 주체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해보면 불이 붙습니다. 제가 몇십 차례는 진행해보았지만, 단 한 번도 한쪽으로 의견이 통일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토론이 진행되어가면서 진영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상황과 질문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잘 풀어내시는 것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의 근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행위의 주체다.’라는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독자 분들도,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 있으시죠? ‘과학자 진영’의 분들이 자주 내세우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상황을 ‘과학자’가 설계를 했고, 실험 참여자는 반응을 한 것일 뿐이니, 주체는 과학자가 맞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험 상황을 보면, 과학자가 A, B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요(물론 random이지만), A 그룹과 B 그룹에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자극을 줄 것인지도 과학자가 설계하였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어느 그룹에 속하였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주체를 과학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뭔가’를 찾는 게 이번 연재에서 저와 독자 분들이 함께 해 나아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상황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 상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상황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마케팅 사례라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상황을 설계하였고, ‘소비자’가 그 설계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입을 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주고,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면 ‘과학자 진영의 분들’은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십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례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소비자’로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실험 상황과 마케팅 상황이 무엇이 다른지를 여쭤보면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사실 상황을 설계한 것이 ‘과학자’에서 ‘회사 CEO’로 바뀌었고, 반응한 사람이 ‘실험 참여자’에서 ‘소비자’로 바뀐 것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주체는 ‘회사 CEO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보시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입고 있으신 옷은 본인이 산 게 맞나요? 그 옷을 산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는 양보 못하십니다. ‘이 옷은 제가 산 게 맞는데요. 이 옷을 산 주체는 저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산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살 때 ‘어떤 마케팅 기법들’이 깔려있는지 알고 구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살 때 ‘어떤 마케팅 기법들’이 깔려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몇 개 알 수도 있겠죠. ‘할인’이라든지 ‘DP’라든지. 하지만 그게 다일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설계가 깔려 있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앞에서 제시한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로 바뀌니까 불편한 마음이 크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던진 질문들의 구조 자체가 의도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할 때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칠면조 상황 → 10달러 상황 → 마케팅 상황 → 내가 산 옷 이야기’ 이 네 가지 상황이 논리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똑같습니다. ‘주체가 누구인가?’ (※칠면조 이야기는 지면 관계상 본 글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네 가지 상황이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비율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설계하고 칠면조가 반응하는 칠면조 상황에서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주체를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칠면조의 행동이 너무 바보 같거든요. 10달러 상황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사람 이야기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주체를 과학자가 아닌, 10달러를 낸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다 마케팅 상황으로 바뀌면 또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내가 산 옷 이야기로 넘어가면 대부분은 ‘회사 CEO’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체를 ‘나’로 여깁니다. 질문의 구조 자체가 ‘나’로부터 먼 곳(동물 이야기)에서 ‘나’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사람들이 대답하는 비율이 바뀌어가고요.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네 가지 상황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내용의 구조는 다르지 않지만, ‘나’와 가까운 이야기가 될수록 생각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자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 때도 많은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내가 옷을 샀는데, 그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냐? 그럼 도대체 뭐가 주체인 거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체를 ‘과학자나 회사 CEO(상황 설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제3의 답안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주장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계속 던져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칠면조 or 과학실험 상황)에서는 답이 ‘상황 설계자’였고, ‘나’와 거리가 가까운 이야기(마케팅 상황 or 내가 산 옷)에서는 답이 ‘행위를 한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면, 그것이 의미가 크므로 같이 생각해보자는 것이 제 의도라면 의도입니다.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각 질문의 논리적 구조에서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상황을 설계하였고, ‘누군가’가 반응을 한 구조는 4가지 이야기 모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답이 바뀌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이 의미가 큰 것입니다. 사실 그 불편한 마음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와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인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의 기원을 알고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만 그제서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과학자’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주체를 ‘10달러를 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제 3안입니다. 오히려 주체를 ‘행위를 한 나’라고 여기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10달러 이야기에서 주체를 과학자(상황 설계자)라고 대답하셨던 분들도 ‘나’에게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행위를 한 나’로 대답을 바꾸게 되는 것을 이번 연재에서 보았습니다. 주체를 ‘행위를 한 나’로 여기는 데서부터 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10달러를 낸 사람이 행위의 주체다.’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행위의 주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시고, 결정적인 부분은 다음 연재에서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어려우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서요. 이 산만 잘 넘으시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은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연재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왔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을 저와 함께 풀어가 보시지요.
※ 본 연재는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 내용을 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