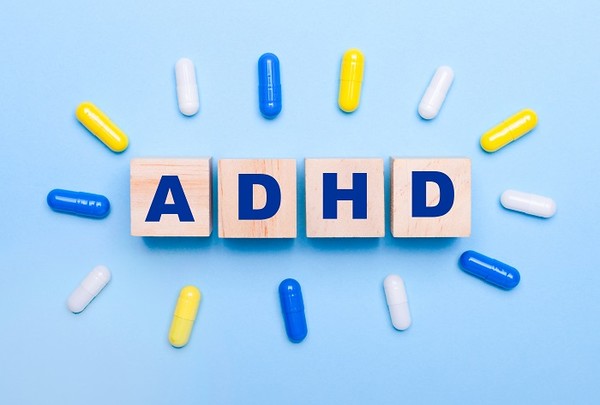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최준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전 글에서 애도반응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지속성 애도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성 애도장애의 진단기준을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 성인의 경우 최소 1년 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경우 최소 6개월 전에 발생하고, 상실 이후 한달 이상 거의 매일 아래의 증상 중 3가지를 경험할 경우 해당됩니다.
- 정체성 붕괴(자신의 일부가 죽은 것 같은 느낌)
- 죽음에 대한 뚜렷한 불신감
-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을 회피
- 죽음과 관련된 강렬한 감정적 고통(분노, 쓰라림, 슬픔 등)
- 재통합의 어려움(친구와의 관계 문제, 관심사 추구, 미래 계획 등)
- 정서적 무감각(정서적 경험의 부재 또는 현저한 감소)
-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느낌
- 극심한 외로움(또는 다름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느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을 잃은 성인의 약 7~10%, 어린이와 청소년 중 약 5~10%가 상실 후 지속성 애도장애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흔하게 불안, 우울, 수면문제를 동반하고 학업이나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므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빨리 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이 오래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상실의 경험도 차츰 삶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능력이 있기에 상실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매우 강한 반응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상실을 받아들이고, 슬픔의 강도는 점차 줄어들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상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종교 공동체, 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감정이 내면에 억압되지 않고 해소되며, 이는 정신적·신체적 긴장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자신의 슬픔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감정적으로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옥시토신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옥시토신은 감정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합니다. 가족, 친구, 또는 공동체와의 유대감이 강화되면 상실의 슬픔이 완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혹 애도의 슬픔에서 벗어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고인과의 연결이 끊어질까봐, 혹은 추억을 잊고 싶지 않아서 등의 복잡한 심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슬픔을 존중하면서도 내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삶을 기념하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나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 방 안에 장소를 선정해두고 작은 의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고인을 추억하고 슬픔을 느끼는 데 할애하면서도 다른 시간에는 자신을 돌보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활동을 이어가면서 그를 잊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애도는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은 때로 오래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그 상실의 경험 또한 우리 삶 속에 녹아들며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보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슬픔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인의 기억을 건강하게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애도의 여정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삼성양재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최준배 원장
[References] 권준수, 김붕년 외 3인. (2023). DSM-5-T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학지사. ; Susan E. Lowey. (2015). Nursing Care at the End of Life. Open SUNY TextbooksLiz Kelly. (2021, Sep 23).16 Different Types of Grief People Experience. Talkspace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상부교수
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마음건강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