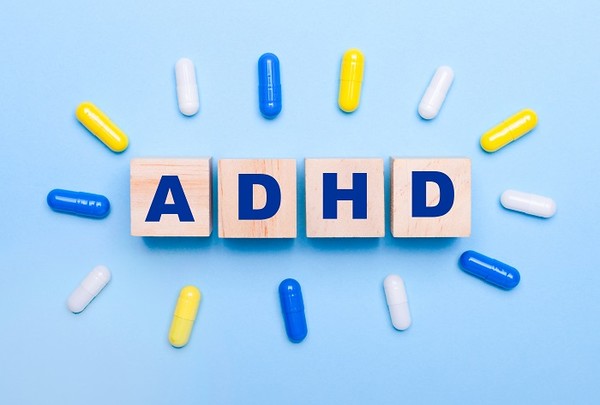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최준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시 중요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상실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깊은 아픔입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과 오랜시간 함께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마치 가족을 잃은 듯한 슬픔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상실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슬픔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거나 깊어질 때는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반려동물을 잃은 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도 되는 걸까 고민하시다가 뒤늦게 진료실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감정 반응이 슬픔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보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자의 기억과 경험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거나 죄책감, 후회, 좌절과 외로움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상’이라며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애도의 과정은 순차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애도’란 상실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축제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며 애도하는 문화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장에서 크게 통곡하거나 조용히 슬픔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애도의 유형을 10가지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기 애도(Anticipatory Grief)’입니다. 예기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 예상될 때 미리 경험하는 슬픔으로, 특히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이는 상실에 대비하고 감정적으로 준비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두려움과 슬픔을 미리 경험하게 하지만, 동시에 작별 인사와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 실제 상실 후 애도 과정을 더 원활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상적 애도(Traumatic Grief)’입니다. 외상적 애도는 충격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나 폭력적인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애도 반응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살아남은 유족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사고 장면이 악몽처럼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했거나 이런 애도를 수개월 이상 겪고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빨리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실에 대한 슬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낙인찍힌 질병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잃은 경우, 임신 중절이나 사산으로 슬픔을 겪는 부모, 또는 이혼과 같은 상실로 인해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가까운 사람을 잃었음에도 슬프거나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깊이 슬퍼하는데 자신은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자신이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걱정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것은 ‘지연된 애도(Delayed Grief)’ 반응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마음이 상실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차단했다가, 시간이 지나 감정을 처리할 준비가 되었을 때 슬픔과 그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왜곡된 애도(Distorted Grief), 누적된 애도(Cumulative Grief), 과장된 애도(Exaggerated Grief) 등 다양한 유형의 애도 반응이 있습니다. 애도는 시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자의 경험과 삶의 태도,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실을 경험한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 강렬한 감정적 고통을 겪거나, 반대로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자신의 일부가 죽은 것 같은 느낌 등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업,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정도라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태입니다. 상실과 관련한 정신과적 질환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이 있으며, 최근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5-TR)에는 지속성 애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라는 진단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지속성 애도장애에 대해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양재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최준배 원장
[References] 권준수, 김붕년 외 3인. (2023). DSM-5-T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학지사 ; Susan E. Lowey. (2015). Nursing Care at the End of Life. ; Open SUNY Textbooks. Liz Kelly. (2021, Sep 23).16 Different Types of Grief People Experience. Talkspace.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상부교수
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마음건강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