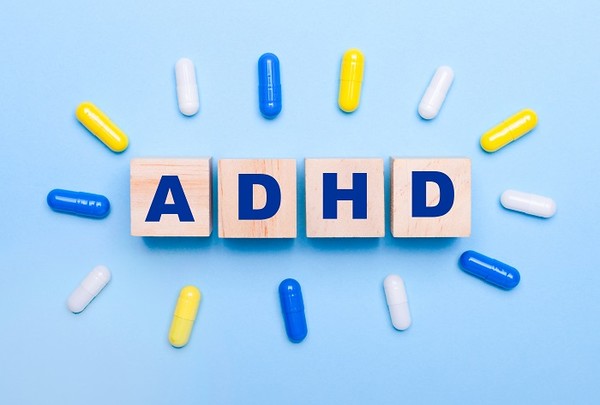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최준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는 지금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산 속에서도, 바다 위 섬에서도 SNS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제아무리 길치라고 하더라도 지도앱 하나면 길을 잃을 걱정이 없고, 해외여행도 두렵지 않지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2700여 개의 위성으로 ‘스타링크’를 구성해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 기세라면 우주에서도 인터넷이 연결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으로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을 보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에는 퇴근길에 미리 집 에어컨을 켜둘 수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인터넷과 정보 기술이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를 바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초연결’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사회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1인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독거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던 고독사가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자주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임을 깨닫고 2018년에 ‘Ministry of Loneliness’ 우리말로는 외로움부 또는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영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인 100명 중 5명은 자주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꼈고, 16%는 가끔, 24%는 때때로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 1인 가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쉽게 느끼며, 특징적인 것은 16~24세 청년이 노인보다 외로움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외로움에 대한 낙인 완화, 지속적인 사회 변화, 외로움에 관한 근거 기반의 이해 및 지식 축적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9개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며 매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일찍이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2009년부터 정신보건, 복지, 취업 지원 등을 종합화한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경기 광명시에서는 고독사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업종 종사자 및 마을 안전 돌보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건강음료 배달원들이 매주 중장년 1인 가구를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안전 돌보미’로 위촉된 지역주민들이 고독사 취약계층 가구와 짝을 이뤄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유대감이 붕괴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생리학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Tomova 등(2020)의 연구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사회적 고립은 중뇌 활성화를 유도하여 금식중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음식 갈망과 유사한 사회적 갈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쾌락중추인 뇌의 복측피개영역(VTA)이 둔화되어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등의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물질 중에서는 옥시토신, 도파민, 코티솔 등이 외로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시토신은 신뢰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외로움을 완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시상하부에서 옥시토신을 생성하는 세포의 밀도를 증가시켜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결핍을 상쇄하려고 시도하지만, 만성적이 되면 결국 옥시토신 농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관련 신경펩타이드가 증가하여 불안 및 우울증을 유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 있을까요? SNS를 통한 소통에 너무 익숙해진 초연결사회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플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사회 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분은 일단 ‘경청’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생각보다는 감정에 공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록 나와 의견은 다르더라도 ‘아,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친절한 말로 공감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대화를 더 이어 나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며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챙김(mindfulness)이나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밧진(Kabat-zinn)은 마음챙김을 통해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임을 인식하면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MBSR 프로그램은 8-10주 간의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환자들이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배워 일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미국 내 200개 이상의 클리닉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동물과 교감하는 것도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상호작용을 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기분을 향상시켜 줍니다.
만약 위와 같은 노력들을 해봐도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거나, 시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무력감이 클 경우에는 꼭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의 원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 받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한 기술적 연결을 넘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연결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외로움,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실천들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고,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삼성양재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최준배 원장
[References] 김아래미. (2023). 외로움에 대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연결된 사회.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겨울), 5–16.
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Vitale, E. M., & Smith, A. S. (2022). Neurobiology of loneliness, isolation, and loss: integrating human and animal perspectives.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16, 846315.
Barton, S., Zovko, A., Müller, C., Krabichler, Q., Schulze, J., Wagner, S., ... & Hurlemann, R. (2024). A translational neuroscience perspective on loneliness: Narrative review focusing on social interaction, illness and oxytocin.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05734.
박태진 컬럼 1 2024.09.02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상부교수
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마음건강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