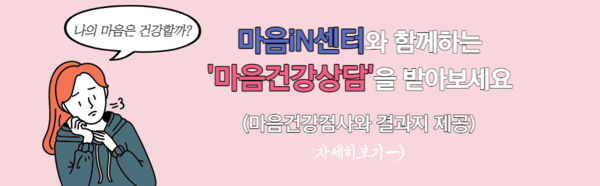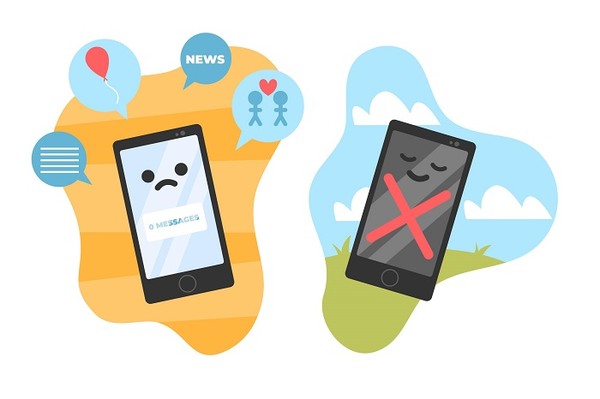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사당 숲 정신과, 최강록 전문의]
코로나 19로 인해 영화관, 콘서트홀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못 간 지 오래되었다. 집에서도 종종 뮤지컬 영상을 찾아보지만, 역시나 현장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 아쉬움만 커질 뿐이다. 특히나 영화보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에 갈 수 없다는 점이 크나큰 속상함으로 다가온다. 배우나 가수, 연주자의 매력을 당장 눈앞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공연을 다 보고 난 후 관객들이 다 같이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박수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도 아쉽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본 공연에 버금가는 감동을 준다. 내가 공연을 보고 느낀 벅찬 감정을,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느꼈다는 표현처럼 감지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산발적이던 박수 소리가 점차 비슷한 박자감을 지니고, 더욱더 큰 소리로 합쳐질 때 그 쾌감은 배가 된다. 규칙적인 박수는 다른 관객들과 합을 맞춰,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예술가에게 감사를 보내는 것이다.
다 같이 치는 박수에 뭉클함, 동질감,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이는 울음소리가 전파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린 시절의 일이다. 같은 반에서 유난히 드세고 거친 아이에게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 후 울고 있을 때, 주위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마치 그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다. 함께 울던 아이들은 그 뒤에 더욱 돈독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위의 경험이 박수를 함께 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떠오른 것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수 소리는 다 다르게 시작하고, 소리마다 다른 강도와 밀도를 지니다가도 어느 순간 비슷한 박자와 소리로 뭉쳐진다. 누군가 리드하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마치 짠 것처럼 비슷하게 박수 소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조(Entrainment)’는 자율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시스템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동기화 과정(Synchronizing Process)이다.
처음 발견한 것은 1665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Christiaan Huygen이다. 실험 과정에서 진자를 각기 다르게 움직이도록 두었는데, 다음날 진자들의 움직임이 동기화되어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한 계기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반딧불들이 동시에 불을 밝히는 것, 인간의 수면-각성 주기가 빛과 어둠의 24시간 주기에 동기화되는 것 또한 동조 현상의 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박수를 칠 때, 점점 같은 박자를 맞추게 되는 것 또한 동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루마니아의 Babes-Bolyai 대학, 이론물리학과 연구팀(Department of Theoretical Physics)에서 ‘같은 공간에서 박수칠 때 자동적으로 박수의 박자가 맞춰지는 것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제목은 ‘집단 박수의 자가 일치(self-organizing) 과정’이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에서 여러 개의 연극과 오페라 공연을 마이크로 녹음한 뒤 분석하였다. 공연이 끝난 뒤 박수 소리는 몇 초간 일관되지 않은 무작위 박수로 시작되었지만 곧 동기화가 일어났다. 동기화 과정에서는 박수 소리의 노이즈가 줄면서 박수의 일치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소음을 낮추고 박수 소리 강도를 높임으로써 동기화의 원동력이 일어나는 걸로 분석하였다. 마치 산발적인 여러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집중되듯이 말이다. ‘동기화’는 서유럽이나 북미보다 동유럽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동질 문화를 공유한 더 작은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는 물리학자들의 연구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조직이 작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수록, 같은 것에 집중하고 있을수록 박수 동조가 더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한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같은 반 아이들이 모여 함께 울어주던 것은 어쩌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같은 세계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며 감정이 공유되지 않았을까.

이 연구는 우리가 청각이라는 감각을 이용해 다른 이들과 같은 결의 감정을 공유하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같은 행위를 동시간 대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뇌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러한 동조나 공명현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옥시토신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 통증으로 고생하던 사람 곁을 지키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하물며 같은 공간에서 동기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동조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떨림과 울림』의 저자이자, 저명한 양자 물리학자 김상욱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물질에는 울림과 떨림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같은 울림과 떨림으로 진동할 수 있다면 다 같이 불안을 증폭시킬 수도 있지만, 함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거나,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더 잘 공감하고 공유하며 응원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요즘 세상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말이다. ‘남의 기쁨은 질투하고, 슬픔은 말할수록 동정만 살뿐이다’라는 우스갯거리 농담이 만연하게 퍼져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대에 하나의 지구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같은 울림과 떨림으로 진동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말은 원래 의미를 충분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울림과 떨림으로 인한 동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이유다.
(전)의료법인 삼정의료재단 삼정병원 대표원장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 애독자 응원 한 마디
-
"선생님 경험까지 알려주셔서 더 와닿아요.!"
"조언 자유를 느꼈어요. 실제로 적용해볼게요"
"늘 따뜻하게 사람을 감싸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