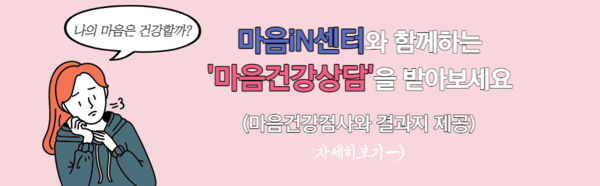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신림 평온 정신과, 전형진 전문의]
‘콜센터 상담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곤 한다. 좁은 공간을 많은 인원이 공유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 노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콜센터 상담사는 고객과 대면하지 않는다는 직업 특성상 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는 곧 정신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콜센터 상담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휴식이 절실한 노동이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 시간은커녕,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상담사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게 현 실정이다. 2021년 콜센터 상담사 실태조사, 32.7%의 상담사가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에서 일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요의를 참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그만큼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

요의를 참는 것과 인지능력의 관계를 알기 위해 진행한 실험을 살펴보자.
건강한 성인에게 15분마다 250mL의 물을 섭취하게 하면서 더는 억제할 수 없을 때까지 요의를 참은 채, 간단한 카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평균 140분까지 요의를 참았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이러한 상태를 바탕으로 시행된 두 가지 카드 테스트 과정은 이러하다.
<실험 1>
(1) 얼굴 그림이 바로 그려진 카드와 거꾸로 그려진 카드를 섞어서 엎어놓고, 한 장씩 넘기며 피실험자에게 보여준다.
(2) 피실험자는 바로 그려진 그림이 나오면 YES, 거꾸로 그려진 그림이 나오면 NO 버튼을 누른다.
<실험 2>
(1) 피실험자에게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연속적으로 한 장씩 보여준 후, ‘특정 카드’를 가리켜 앞에서 보았던 카드 중 같은 것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2) 피실험자는 기억 속에서 정보를 찾아 동일한 카드를 보았는지, 혹은 안 보았는지 대답한다.
두 가지 실험 모두 카드를 각 35개를 맞출 때까지 진행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테스트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녹록지 않았다. <실험 1>의 결과, 요의를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각적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속도가 감소했다. <실험 2>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기억 즉, ‘작업기억’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또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의를 참는 것은 24시간 내내 수면에 들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인지 저하를 일으켰다. 즉, 요의를 참으며 일을 하는 건 오히려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셈이다.
이는 뇌 부위 중 대뇌 반구 안쪽 면에서 뇌들보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회(Cingulate cortex)’와 관련이 있다. 방광조절과 배뇨 관련 시스템에서는 요의가 강해질수록 대상회를 억제하는 신호가 강해진다. 따라서, 요의가 대상회를 억제하며 대상회의 역할 중 하나인 인지기능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요의를 참는 것에 따른 작업기억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해석은, MRI 데이터 기반이 아닌 연구자들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방광 조절의 신경과학적 모델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을 뿐, 그 결과는 기존의 뇌 행동 모델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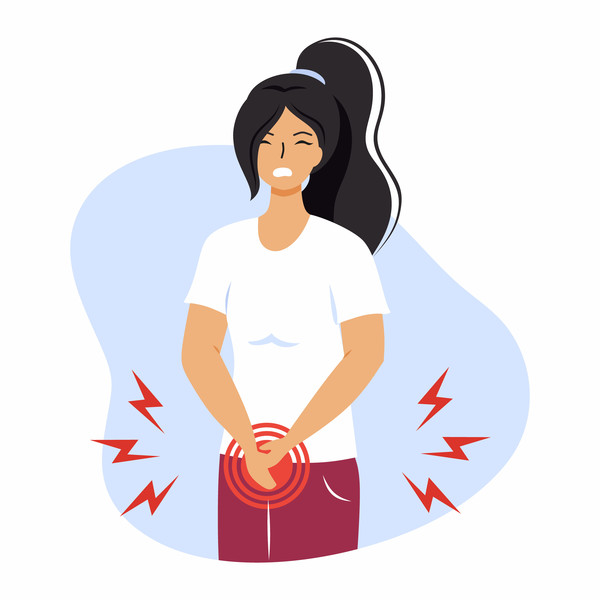
인지의 본질은 판단이며, 인지 기능 작동의 저하는 곧 판단력의 저하를 말한다. 무슨 일이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그에 대한 선택은 필수적이다. 잘못된 판단은 일을 그르치는 유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배뇨를 참으면서까지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업무 효율 향상은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뇌의 충분한 휴식을 통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지하철 기관사는 운행에 들어가면 3시간 이상 기관실에서 나오지 못한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좁은 기관실 내 배변 봉투를 이용한 간이 화장실을 스스로 설치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후번 기관사와 교대할 수 없고, 지하철 열차 내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콜센터 상담사뿐 아니라 택배 배송, 청소 노동 등 다양한 직군에서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노동자의 업무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졌던 지난 뉴스들을 보며 우리는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환경 개선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이 더 많이 쌓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