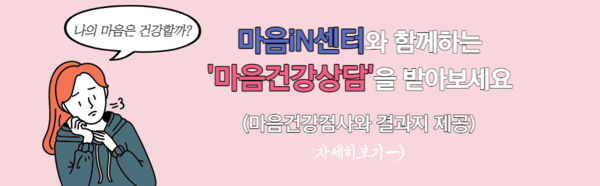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당산 숲 정신과, 이슬기 전문의]
카페나 길거리, 놀이터 등 우리는 어디에서건 쉽게 욕설을 들을 수 있다. 화를 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추임새로 욕설을 쓰기 때문이다. 다양한 말 가운데 굳이 욕설을 섞어 사용하는 것은 영 달갑지 않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가구 모서리에 발등을 찧거나, 종이에 손이 베이면 깜짝 놀라 욕이 튀어나오곤 했다.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욕설을 뱉어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의도해서 욕을 한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에 가깝다. 평소에 점잖고 세련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위기일발의 상황에선 왜 욕설이 튀어나오는 것일까? 욕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2009년 영국의 Keele University의 연구에 다르면 욕설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욕설과 통증 감소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통증 인식 및 심박수를 측정한 것이다. 총 67명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 실험과정은 이러하다.
1. 한 그룹은 5℃, 또 다른 한 그룹은 25℃의 물이 담긴 물통에 손을 담근다.
2. 1번의 상태를 유지하며 욕설과 중립 단어를 반복하여(일정 속도 유지) 말하도록 한다.
3.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심박수를 체크하고 고통, 불안, 통증에 대한 두려움, 인지되는 통증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 욕을 하면 욕을 하지 않을 때보다 통증 내성이 증가하며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욕설이 Fight-or-Flight(투쟁 도피 반응)를 유발해 공격성의 역할을 한다고 추측했다. 또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정말로 통증을 인식하는 과정에 끼어든다는 추측도 가능했다. 두려움과 통증 인식 사이의 연결을 욕설이 무효화시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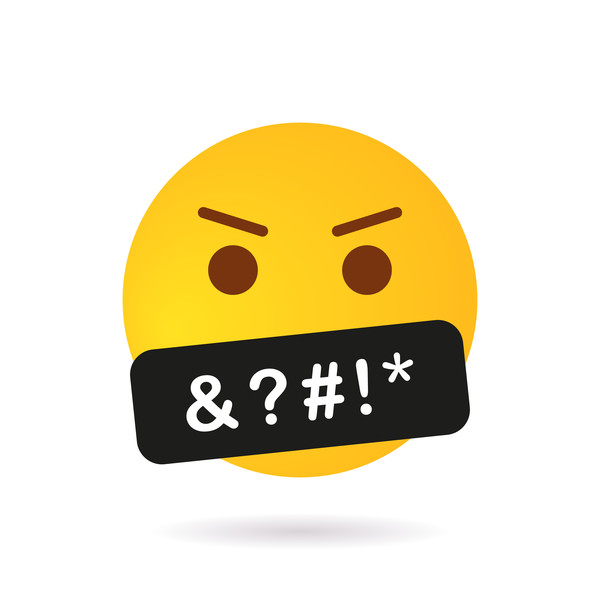
2017년, 일본인(39명), 영국인(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가졌다. 위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를 국적과 무관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 상온 물과 얼음물에 손을 담근 채 무작위 할당으로 욕설과 중립단어를 배정했다. 결과는 첫 번째 실험과 동일했다.
즉, 욕의 사용 빈도 및 문화적 차이 없이 욕을 한 그룹이 통증을 덜 느끼고, 통증에 오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욕설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욕설은 곧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뇌중의 최고봉인 전전두엽(PFC)의 내측은 사회적 결정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손상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욕설의 억제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발표된 바 있다.
인지 과학자 Benjamin Bergen은 자동적, 자발적으로 나오는 욕을 오래된 진화의 반사작용으로 보았다. 종이에 손가락을 베이거나, 발가락을 가구 모서리에 찧을 때 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영장류 및 포유류와 공유하는 뇌의 한 부분이다. 두려움이나 분노를 경험할 때 보이는 격투 반응의 일부이기도 하다.
인간도 동물의 일부이기에 갑작스런 통증이 느껴질 때는,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욕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욕설과 습관적, 의도적으로 뱉는 욕설은 전혀 다르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자극과 행동(혹은 말) 사이의 간극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빅터 플랭크(Viktor Frankl)의 말처럼 말이다.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 대전,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의사
(전) 서울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