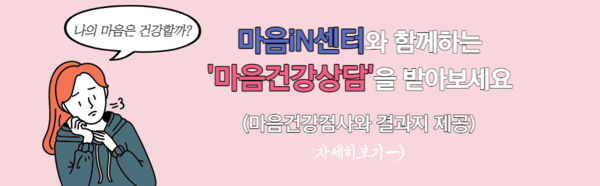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당산 숲 정신과, 이슬기 전문의]
여섯 일곱 살쯤 되는 아이들이 허리를 숙인 채 코끼리 코를 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노는 것을 보았다. 서른 바퀴쯤 돌고 고개를 든 아이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지 웃었다. 어지럽지 않을까, 너무 세게 돌면 신체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며 바라보던 내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은 즐거워 보였다.
나도 어렸을 때는 많이도 돌았다. 무용 동작을 흉내 내며 빠른 속도로 제자리에서 돌기도 하고, 스케이트장에 가면 선수들을 따라 피겨스케이팅 스핀을 돌았다. 돌고 난 후에는 어지럼증이 가실 때까지 한동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굉장히 빠른 스핀 이후 바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던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
피겨스케이팅뿐 아니다. 원반 던지기와 해머 던지기도 스핀을 사용하는 스포츠이다. 스핀을 필수로 하는 스포츠는 어지러움 또한 훈련하는 것일까? 어지러움을 잘 견디는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물론 과한 스핀 동작이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어지럼증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피겨스케이팅, 해머 던지기와 달리 특히 원반 던지기에서 더욱 큰 어지럼증(구토 동반 등)으로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다 같은 스핀이라도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일까?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이와 관련해 진행한 실험을 살펴보자.
평균 11년의 훈련 기간을 지닌 원반 던지기와 해머 던지기 선수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선수들이 원반 던지기와 해머 던지기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촬영한 슬로우 모션 영상 120개를 신경생리학 전문의 3명,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등이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해머 던지기에서는 불편감을 느끼는 선수가 없었으나, 원반 던지기에서는 59%의 선수가 구토감 등의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해머와 원반 모두 스핀을 돈 후에 던지는 스포츠이지만 그 차이점은 확실했다.
원인은 원반 던지기와 해머 던지기에서 ‘던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있었다. 발을 축으로 하여 몸을 회전하는 동작인 '피벗 로테이션(pivot rotation)'은 두 스포츠가 공통으로 하는 회전 기술이다. 하지만 던지는 순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해머 던지기는 무거운 중량의 해머를 회전시키며 몸과 해머 사이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최대로 증가시킨 후 던진다. 즉 땅에 딛고 있는 발을 축으로 한다. 이에 반해 원반 던지기는 회전 동작을 통해 발생한 원심력이 원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투척 요건이다. 원반을 던지는 순간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는 동작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visual bearings(시각적 방향)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방향을 상실하고 균형감을 잃게 된다. 그 때문에 더욱 큰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즉, 중요한 것은 발바닥의 정보를 기반으로 나와 공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아-공간’ 관계가 손상되면 회전 중에 시각적 단서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빠른 스핀을 돈 후에도 균형을 잘 잡고 다음 동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겨스케이팅의 회전에서는 ‘자아-공간’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다. 회전 중에 천장에 있는 점을 의식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빠르게 안정감을 찾기 때문이다. 시선 고정은 회전식 안구진탕증(nystagmus: 무의식적으로 눈이 움직이는 증상)을 억제한다.
자신과 공간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할 시 어지러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비단 신체적 증상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으로부터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인식한다.
살아가는 도중에 “나는 지금 뭘 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같은 삶에 대한 질문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혼란함은 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잊어버렸을 때 일어난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은 등대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 등대 빛이 없다면 안정감을 잃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삶의 균형감을 잃을 수 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있더라도,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낸다면 다시금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 언젠가 이루고 싶은 목표 등등. 우리는 당장 먹고사는 것에 바빠 각자의 등대가 있다는 걸 잊을 때가 있다. 등대 빛이 더 멀리 가 닿을 수 있으려면 잠시 멈춰서 등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디로 향하는 중이었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잊어버리고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잠시만이라도 멈추어서 지금 자신의 발밑을 한번 바라보자.
그 순간 당신의 한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 대전,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의사
(전) 서울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