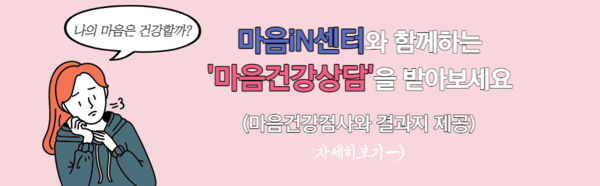23화 병원의 정원
2018년 04월 13일, 나는 내 발로 정신병원을 찾았다. 그 당시 나로서는 정말 큰 용기를 낸 셈이다. 예약을 해야 한다는 말에, 아무 날이나 잡아서 아무 시간이나 잡았다. 정작 그 아무 날이 다가오자 두렵고 떨렸다. 괜히 주눅이 들었고, 어디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나는 과연 병원에 갈 정도의 사람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신병원은 더 큰 문제를 가져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약속에 끌려가듯 갔다. 도착하니, 의외로 의사를 바로 만나는 일은 없었다. 엄청난 문진표 및 검사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초진은 40분가량 진행되었다. 나의 배경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셨고, 주요 병을 찾는데 집중하셨다.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 나에게는 몇 개의 F 코드가 붙었다. 코드는 병원에서 과마다 편의상 붙이는 행정적 분류이고, 각자 알파벳으로 구분한다. 정신의학과는 대개 F 코드로 표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일상에 복잡한 변수가 생겼고, 심리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겼다. 집에서 나가지 않고, 밥과 약도 잘 먹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환자가 약을 끊는 경우, 단약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거나 체온조절이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대표적 예이다. 선생님은 이런 나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밖으로 나를 끌어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상담 말미에 꼭 짧게라도 밖에 나오라는 언급을 자주 하셨고, 나는 말을 듣지 않았다.
선생님은 선언하셨다.
나와는 일체 상의도 없이 일주일에 두 번을 상담하러 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동안 외출하라는 숙제를 너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입은 삐죽 나왔지만, 반항해볼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을 가게 되면서, 병원에 머무를 시간이 두 배로 늘게 되었다. 자연스레 병원 이곳저곳을 살펴보게 되었고,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병원 이름에는 ‘숲’이 들어있었다.
이 점이 나를 이 병원을 찾게 한 점 중에 하나였다. ‘병원 이름에 숲을 쓸 생각을 하다니, 그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 같은 것이었다. 위화감은 여전히 들었다. 몇 주에 걸쳐 고민한 끝에 얻은 답은 ‘식물’이었다. 병원에 식물이라고는 병원 개업식 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무나무와, 몇 그루의 난(蘭)이 전부였다. ‘숲’에 대한 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모습이었다.
‘숲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니, 이건 너무 실망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참 식물에 심취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선생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식물을 하나 둘 들이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약한 빛을 받으면서도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개체를 찾아야 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꽤나 많은 식물들이 머물기도, 떠나기도 하면서 지금의 작은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병원에는 내가 아끼는 ‘두 갸르송’이라는 토분도 하나 숨겨두었다. 두 갸르송에 진심인 내가, 구하기도 힘들고, 갖고 있다 한들 누구도 쉽게 줄 수 없는 그것을 병원에 가져다 놓았다는 건 꽤나 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진정 작은 정원을 가꾸는데 진심이었다. 두 갸르송은 그것의 징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식물도 있는데, 허발리움(Herbalrium)이라는 존재가 있다. 사무실처럼 해가 잘 들지 않고, 실내 환경이 건조하고 식물에 알맞지 않은 곳에 두고 보기 좋은 존재이다. 식물을 특처리한 용액에 담가 투명한 유리병에 두고 보도록 한 제품이다. 식물에서 색이 점점 빠져나와 몇 년이 지나면 버려야 할 수 있다지만, 일반적인 식물이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손도 덜 가고, 마음도 편한 방법일 수 있다. 허발리움도 네 종류를 테이블에 놓았는데, 종종 병원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나는 이 색이 예쁘다, 아니다 나는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하는 대화를 듣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듯이 어디에서든 식물에게 영생은 없다. 식물은 탄생과 죽음이 있고, 그 과정의 찬란함과 수명의 주기가 다를 뿐 어쨌든 저무는 시간이 존재한다. 나는 사무실에서도 최대한의 복지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곁에서 최선을 다해줄 뿐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날의 나처럼, 온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식물은, 어떤 때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안정 효과를 줄 때가 많다. 그래서 도시 조경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걸으며 조금씩 힘을 얻는 것이다. 마음과 몸에 긴장을 잔뜩 하고, 예약을 해서 오긴 와야 했으니까 온, 수많은 초진자들에게 사사로운 힘을 주고 싶다.
* 매주 2회 수, 금요일 글이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