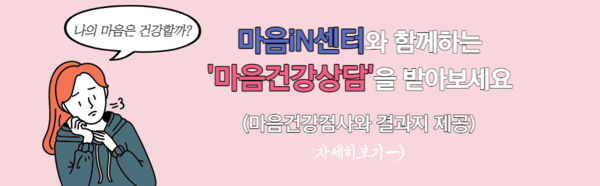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신림 평온 정신과, 전형진 전문의]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보복하고 싶어진 적 있는가? 칼을 가는 복수심은 아니더라도 ‘만원 지하철이나 타라’라든지, ‘퇴근할 때 회사에 핸드폰 놓고 나가라’든지, ‘길 가다 넘어져라’ 등 소심한 주문을 외운 적은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 인간관계에서 화나는 일이 생길 때, 급작스럽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에 없던 술 약속을 잡는다. 친구에게 그 사람의 흉을 보고 실컷 욕한다. 그렇게 한바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다.
소심한 복수를 바라는 자신의 모습은 치졸하게 느껴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비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던데, 난 자존감이 낮은 걸까. 직접적인 복수는 하지 않고 마치 부두 인형에 분풀이를 하듯 사소한 복수만 상상하다 마는 건 어딘가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다.
세상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실제로 부두 인형을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 부두 인형(Voodoo Doll)은 사람을 저주할 때 쓰는 인형이다. 누더기로 대충 만든 인형에 사진을 붙이고, 바늘로 찌르는 형태로 묘사된다. 인형에게 가한 위해가 저주 대상에게도 전달된다고 한다. 이성적으로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지만,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복수에 대해 생각하거나 부두 인형을 사용하는 것이 저주에 유효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 확실하다. 그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를 살펴보자.
사회과학 저널 ‘The Leadership Quarterly’에 실린 이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상의 상사를 상상하게 한 후, 그 상사가 부당한 대우와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했다.
한 그룹에는 부두 인형에 상사의 이름을 붙이게 하고 핀, 펜치 등의 도구를 인형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다른 그룹은 인형에 이름이 아닌 ‘Nobody’ 표시를 하고 그냥 쳐다만 보라고 했다. 이후 면접 및 사후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핀이나 펜치 등 도구를 사용했던 그룹은 상징적인 보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 상사가 주는 부당함을 덜 민감하게 지각했다. 이름도 붙이지 못하고 쳐다만 보게 했던 그룹에서는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그 대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두 인형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덜 민감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상징적인 보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가치 있는 것 보상으로 주고받게 된다. 이를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한다. 사회 교환에서는 공정성의 기본 바탕을 이룬다. 또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사랑, 인정, 노력 같은 심리적인 개념도 포함된다. 내가 직장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만큼의 인정이 돌아오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등가를 회복시키고 싶어진다.
많은 인류학자는 공정성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중 하나라고 보았다. 보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사회 교환의 등가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의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일수록 지속적해서 사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를 자신에게 가치 있는 노력, 시간 등을 계속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식하여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작은 억울함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은 나도 모르게 편향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는다면, 귀여운 복수의 주문을 하거나 친구와 상대를 욕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돌보는 한에서 말이다.
사극 드라마에는 부두 인형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상대가 불행해지고 망가지길 바라는 그 모습은 추악하고 공포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부두 인형으로 상대를 저주하기까지 당사자만의 이유와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실제적인 복수는 하지 못하고 뒤에서 부두 인형을 사용해 저주하는 이의 심정을 추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짚으로 만든 부두 인형에 저주하는 장면은 켜켜이 쌓이는 억울함을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면에 쌓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곳이 없거나, 해소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의 애처로운 의식이 아닌가 싶다.
부두 인형 말고 걱정 인형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걱정 인형(Worry Dolls)’은 말 그대로 걱정을 대신해주는 인형이다. 걱정이나 공포로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부모가 가방이나 상자에 넣어 선물해주던 것이 그 유래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부두 인형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돌본 후에, 걱정 인형으로 내 걱정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주와 복수, 원망하는 마음보다 걱정 인형이 내 걱정을 대신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걱정이 한층 줄어들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