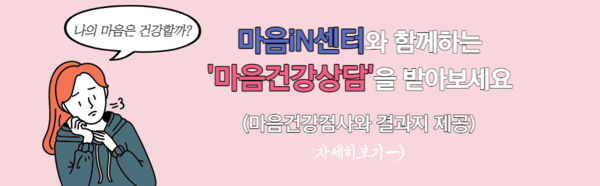심리학 렌즈 (1)
[정신의학신문 :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협상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문 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 작은 요구부터 시작해서 큰 요구까지 하라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실험은 다음과 같다.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누어서 A 그룹에는 작은 조치를 취하였고, B 그룹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 그룹에 한 작은 조치는 한 아이가 집 앞에 찾아가서 안전운전 캠페인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일도 아니고, 서명을 하는 것이 그리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이 아니기에(작은 요구) 캠페인 서명에 응하였다. 그런 다음에 A 그룹과 B 그룹에 본격적인 요구를 해보았다. 집 마당에 안전운전에 관한 흉한 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과연 두 그룹에서 차이가 있었을까? 작은 부탁을 먼저 들어줬던 A 그룹에서는 55%가 표지판 설치에 응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B 그룹은 17%만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서명이나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요구들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에 두고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마트에서 날아오는 전단지를 보면 말도 안 되게 싸게 파는 것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 정도이다. 이런 걸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데, 마트는 그 상품을 팔아서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단 마트 문 간에 발을 들이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미끼상품을 사기 위해 문 간에 발을 들이면 다른 상품들도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다. 요즘 많은 앱들을 보면, 가입만 하면 커피 쿠폰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공짜로 주겠다는 곳이 넘쳐난다. 다 ‘일단 우리 문 간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신호이다. 최근 사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머지포인트도 같은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만약 20%의 포인트를 상회할 만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구조라면 신사업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후 가입자의 돈으로 이전 가입자의 포인트를 메꾸는 구조라면 폰지 사기로 결말이 날 것이다. 어찌 보면 사기와 마케팅은 한 끗 차이일 수도 있다. 사기이든 마케팅이든 결국은 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간에 발 들여놓기’와 반대되는 전략도 있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라고 하는데, 큰 요구부터 시작해서 양보해가라는 전략이다. 정치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내가 처음에 원했던 요구가 6이더라도 요구를 크게 10으로 하는 것이다. 협상을 해가면서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원했던 요구가 6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보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잘 찾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꽤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그만큼 효과적이기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일 테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것 같다. ‘문 간에 발 들여놓기’에서는 작은 요구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또 ‘면전에서 문 닫기’에서는 큰 요구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니, ‘나 보고 어쩌라고?’라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을 거 같다. 이걸 구별해야 내가 일상생활에서 두 전략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두 전략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느냐’의 유무에 따라 갈린다. 협상의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없는 경우라면 ‘문 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 유리하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다.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도 소비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의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경우라면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유리하다. 정치에서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많이 쓰이는 이유도, 정치라는 특성상 어떠한 안으로 라든 협상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남녀 사이를 예로 들어보면 명확할 거 같다. 만약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 때는 ‘문 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 더 유리하다. 처음부터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을 쓰게 되면 부담감에 도망갈 확률이 높다. 그러다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고, 부부 사이가 되었을 때에는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더 유리하다.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부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마케팅과 사기가 한 끗 차이이듯, 이러한 심리 전략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 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심리 전략들을 잘 알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하지 못 한 관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는 것에는 선악이 없다. 아는 것을 활용하는 방식에 선악이 있을 뿐. 많이 알고, 그것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본 글은 쿠키건강TV 마인드온 - 정신과의사 이일준의 심리학 렌즈 31회 ‘사기의 심리’ 방송분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