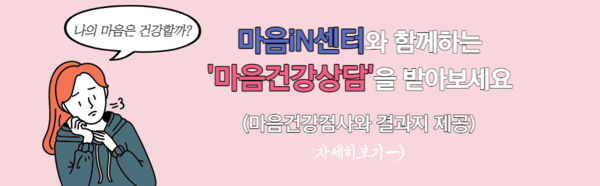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정신의학신문 : 광화문 숲 정신과, 정정엽 전문의]
작년보다 한층 짙어진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 2021 도쿄 올림픽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열정적인 스포츠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기 충분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은 메달 획득 및 좋은 경기와 더불어 더욱이 화제가 되는 것이 있다. 경기에서 패하고도 상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선수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유도 중량급 선수 조구함은 결승에서 일본 선수인 에런 울프와 접전을 벌이다가 은메달을 기록했다. 금메달을 코앞에 둔 결승이었으며, 도쿄 올림픽에서 한 첫 유도 한일전이었기에 충분히 아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조구함은 좌절하거나 아쉬워하는 게 아닌 뜻밖의 모습을 보였다.
조구함은 경기가 끝난 뒤 한동안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치열한 경기를 벌였던 승자 울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울프의 왼팔 옷깃을 잡아 위로 들어 올렸다. 상대의 승리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담긴 행위였다. 땀에 젖은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결연해 보이기도 하고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조구함은 경기가 끝난 시점, 무슨 생각을 하고 일어나 울프의 팔을 들어주었을까. 조구함이 보여준 태도는 승자만큼이나 빛났으며, 스포츠 경기를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조구함뿐만이 아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선수들의 성숙한 대응이 유난히 눈에 띈다. 승부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림픽 경기를 즐기고 있다. 우리는 왜 이런 모습에 감동하고, 성숙함을 느끼는 것일까?
스포츠의 속성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과열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경향의 위험한 스포츠 정신이 도래한다.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예로, 신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행력 향상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승리는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생의 다른 부분을 희생하기도 한다. 이기고 지는 것에만 가치를 두면 패배했을 시 상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불가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과연 ‘패자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실천 및 현장 중심의 스포트 철학』의 저자 스콧 크레치마르(R.Scott Kretchmar)는 패배 즉, 지는 것은 경쟁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패자가 있어야 승자가 있고, 죽음이 있어야 삶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는 스포츠 철학적 관점에서 ‘완화와 초월’이라는 패자에겐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완화’는 이기고 지는 것에 압도된 상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에 패하고 경기장을 나서는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코치, 어깨를 두드리며 엄지손가락을 올려주는 동료 선수들. 이는 그동안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태도로,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는 선수가 패배감에 압도되지 않도록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의사인 C.R. 클로닝어(C.R.Cloninger)가 성격의 한 요소로 이야기했던 ‘자기수용(Self-Acceptance)’과 ‘자기일치(Self-Congruence)’와 연관지어볼 수 있다.
자기수용이 높으면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한계까지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자기일치가 낮은 사람은 타인의 제안 등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 다이어트를 결심(목표)하고서 바로 그날 저녁 햄버거(유혹)를 먹자는 친구의 말에 따르는 것과 같다. 그에 비해 자기일치가 높은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여, 자신의 신념 및 가치를 뚜렷하게 지켜나간다.
‘초월’은 패배를 현재의 승부 그 이상의 가치 즉, 다음 경기를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많은 승부가 있어왔던 것과 같이 현재 맞닥뜨린 한 번의 패배 또한 다음을 위한 과정으로 본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더 멀리 보는 태도다. 육체적 한계를 넘기 위한 과정, 더 나아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과정의 한 걸음으로 패배를 대한다.
이 또한 클로닝어가 성격의 한 요소 중 하나다. 클로닝어는 자기 초월이 높을수록 참을성이 많고 창조적이며, 불확실성을 잘 견디고 자신이 하는 황동을 즐길 수 있다고 정의했다.
자기수용, 자기일치, 자기 초월 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숙도가 높다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Being'의 존재로 본다. 현재를 결과가 아닌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하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의 태도와 같다. 지혜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아닐까.
결국, 패배하고도 품위와 예의를 지키는 선수들의 모습은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다.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희생의 대상이다. 하지만 어느 경기든 한 번의 패배가 삶을 결정짓지 않기에, 우리는 그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죽음이 없다면 삶이 없듯이, 패배가 없는 스포츠는 없다. ‘패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 이사, 사무총장
서울고등검찰청 정신건강자문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위원, 산림청 산림치유포럼 이사
저서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합니다>
- 애독자 응원 한 마디
-
"연주를 듣는 것 같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많은 사람이 도움 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선생님의 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