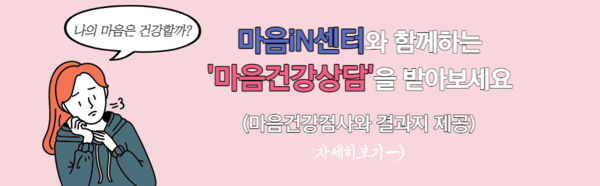14화 고사리와 감기의 상관관계
고사리, 하면 보통은 먹는 나물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사리란 양치류(fern)에 속하는 식물을 떠올린다. 블루스타 펀, 아디아텀, 후마타, 노무라, 아비스, 만다이아넘, 다바나 등 고사리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다. 고사리는 보통 숲에서 나무 밑동에 자리 잡고 살아간다. 우거진 숲에, 큰 나무가 해를 다 가려줘서 어두운데, 음습한 편인 장소이다.


내가 독립을 한지 만 3년, 햇수로 4년째이다. 그 사이 나는 많은 식물을 들였고, 많은 식물과 이별했다. 보통은 수많은 식물들을 집에서 최대한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려고 노력한다. 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들은 창가나 베란다, 그보다 해에 덜 예민한 식물은 그 뒤로 바짝, 응달진 곳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비교적 어두운 곳, 고사리는 예외 없이 집안, 가습기를 둘러싸고 살고 있다. 식물을 좋아하는, 특히 고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습기에 예민한 편이다. 고사리가 습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나도 나름 식물 집사 이기 때문에, 온습도에 예민한 편이며 나 자신도 온습도에 예민한 편이다.
약간 어두운데, 촉촉한 가습기가 돌고 있는 자리는 보통 침대 근처이다. 그러다 보니 나와 고사리는 비교적 다른 식물보다 가까이 지내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더 많아졌다. 덕분에 집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다. 그러다 요새는 감기 같은 것에만 걸려도 사람들은 예민하니,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을 때 문득 내가 몇 년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확히 세어보니 3년째였다. 이건 우연이기에는 몇몇 이유가 감지되었다. 첫 번째,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 두 번째, 식물을 마음껏 들였다. 세 번째, 고사리 존이 언제나 내 곁에 있다.

세 번째 이유를 깨닫고 오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가습기 물을 갈아줄 때마다 세상에 있는 물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귀찮아하고, 고사리에 물을 줄 때마다 건성건성이었다. 그런데 실은 그게 다 나를 위한 것 이기도 했다니 부끄럽고 또 놀라웠다.
세 번째 이유는 이사를 하고 명확해졌다. 이사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겼는데, 평수가 훨씬 커지고, 베란다가 생겼으며, 고로, 대부분의 식물들이 베란다로 이사를 갔다. 방에 얼마 남지 않은 몬스테라나, 손이 많이 가는 식물, 그리고 고사리가 남았다. 그런데 이사 적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고사리 잎사귀가 타 들어갔다. 그리고 그건 나도 느꼈다. 방이 매우 쾌적하고 동시에 건조하다는 것을. 식물이 빠진 만큼 방안 식물 밀도가 낮아지면서 집안의 습기가 훨씬 낮아진 것이었다. 대신 베란다 습도는 언제나 80 이상을 유지하며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신나 있었다.



보통 기초화장품을 바르는 정도로는 얼굴이 건조해서 당겼고, 더 수분감이 있는 제품을 찾아야 했다. 손끝 발끝은 여지없이 건조해서 갈라졌다. 동시에 고사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축 늘어져 있고, 잎사귀가 타 들어가고 있었다. 공중 습도에 예민한 식물들이다 보니, 타 들어간다고 물을 계속 더 주면 과습으로 죽어버린다. 어떻게든 방 안의 습도를 올려야만 했다. 해결책이 찾아, 지금은 침대 옆 스툴에 분무기를 두고 수시로 뿌려주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공생관계라는 글을 수시로 보며 배우며 자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인간은 스스로가 바이러스가 아니었을까?’하는 유쾌하지 못한 생각도 든다. 답은 모르겠다. 다만, 우리 집 안의 식구들은 식물도 포함되며, 그들과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식물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식물 집착 인간이 또 되어버리는 것이다.
식물을 키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무척 좋았던 것이 맞다. 새싹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딱딱한 식물들이 연한 새 잎을 내면, 내가 다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작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 나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옅게 새겨주었다. 이제는 신체 건강에도 좋다는 결론이 나버리니, 나에게 식물은 어쩌면 작고 소중한 인연 같은 것 아니었나···. 감히 짐작해본다.
* 매주 2회 수, 금요일 글이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