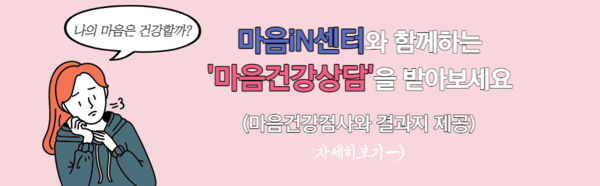내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 (5)
대담은 대한정신건강재단 정정엽 마음소통센터장과 한국적 정신치료의 2세대로 불교정신치료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전현수 박사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정엽: 몸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전현수: 몸도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죠. 우리 몸의 세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현미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삼매를 닦아서 지혜의 눈이 열리면 현미경처럼 볼 수가 있어요. 현미경은 물질적인 것만 봐요. 하지만 삼매를 통해서 얻은 지혜의 눈은 궁극적인 어떤 물질과 정신적인 것도 볼 수 있어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먹는 음식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의해서도 물질이 생겨요. 그중 하나가 마음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손을 들어야겠다는 의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생겨 이동하면서 딱 닿는 순간에 손을 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만들어내서 그 물질이 성대를 치는 순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보니까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마음에서 만드는 물질이 몸을 움직여요.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음이 중요해요. 몸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몸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은 그냥 있고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정정엽: 그러면 마음은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나요?
전현수: 마음도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마음을 잘 보면 언제나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 영향을 받아요. 좋은 대상에 가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대상에 가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마음이 어느 대상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길이 나요. 길이 나서 가만히 있어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2003년도에 알고 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안 좋은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고 싶지 않아도 안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치료라는 것은 좋은 대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쁜 대상은 과거와 미래에요. 좋은 대상은 현재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서 과거와 미래가 왜 나쁜 대상이냐면 과거도 두 종류가 있겠죠. 좋은 과거가 있고 나쁜 과거가 있어요. 나쁜 과거를 생각하면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기분도 나쁜 거예요. 억울하고 아쉬움이 남죠. 당연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추억 같은 것도 잘 보면 한계가 있어요. 물론 나쁜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재 삶에 만족한 사람이 좋은 과거를 떠올릴까요? 위안이 필요할 때 ‘나도 그땐 참 좋았지…….’ 하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추억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현재가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모든 과거는 다 안 좋은 대상에 넣을 수 있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건 무조건 안 좋아요. 계획을 세우거나 기다리는 행위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정엽: 과거와 미래는 나쁜 대상이고, 현재는 좋은 대상이라는 말은 쉽지 않은데요?
전현수: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면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는 좋은 대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예요. 사람들은 단순한 생각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보다 더한 실제가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때 우리가 신경전달물질 이론으로 보면 안 좋은 물질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 일은 한 번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겠어요?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난데없이 말할 수도 있고, 알고 있더라도 입을 꿰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과거는 이런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집에 가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어떤 논문을 보니까 생각을 하면 안 좋은 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다섯 번 생각하면 다섯 번 기분이 나쁘고 다섯 번 변화가 와요. 실제로 있었던 과거는 한 번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현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누가 내 뺨을 때렸을 때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얼얼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건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 수행하면서 생각의 속성을 깨달았어요. 저는 생각은 뇌가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찰력이 생기니까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하면 뇌를 놓아버렸어요. 17년 동안 그런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되도록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도움이 안 되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즉각 옮기도록 훈련을 해야 해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각도 많아요. 생각이 적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정엽: 뺨을 맞았는데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의미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현수: 긍정 부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보질 못하니까 손해나는 일을 계속해요. 우리한테 도움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기분 나쁠 때 그냥 기분 나쁜 거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불건전하게 쌓여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건전하게 쌓이면 정신이 건강해지죠. 우리가 자신을 너무 모르니까 화내고 짜증을 내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기분 나쁜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삼매를 통해 지혜의 눈이 열려서 궁극적인 정신을 보잖아요? 우리는 잘못 보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쁜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기분 나쁜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의문전향(意門轉向)’이라는 정신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어서 일곱 번의 ‘속행(速行)’이라는 정신이 일어나요.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은 기능만 하는 거여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좋은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속행일 때 이게 해로운 마음이 되면 해로운 어떤 정신의 요소들이 연쇄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마음은 언제나 물질을 만들어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몸이 무겁잖아요? 그건 미세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물질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정신이 결과를 가지고 와요. 하나하나의 속행에 정신들이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문제는 1초에 각각의 정신이 1조 번의 일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책을 쓰면 수없이 일어난다고 적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가까운 사람이 1조 번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한테 사실인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 유튜브 많잖아요? 과학 유튜브에 이런 게 있더래요. 미국의 AI 전문 교수에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우리 뇌는 1초에 1조 이상의 연산을 한대요. 일본의 슈퍼컴퓨터는 1초에 44경의 연산을 한다네요. 연산 계산은 어떻게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시놉시스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부터는 저도 책에 1조 번 일어난다고 자신 있게 써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알게 되면 누가 때려도 화를 안 내게 돼요. 화를 내면 나한테 손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벌어지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