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박사 이광민의 [슬기롭게 암과 동행하는 방법] (8)
[정신의학신문 : 마인드랩 공간 정신과, 이광민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Q1: 저는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따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너무 힘들어요.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A: 막상 내가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염려가 정말 많이 들죠.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들게 되기 쉽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더 고립되어 버리죠. 결국, 혼자가 아닐 수 있음에도 혼자되는 것을 자처하는 셈입니다.
나의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만 줘도 일종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갇힌 자신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고잉 온 토크’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면서 얻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나쁜 상황을 머릿속으로 가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거기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불안은 부정적으로 더 극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거기서 내가 생각을 끊어 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부정적인 가정에서 내가 처한 현실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은 하나의 가정이거든요. 대부분 ‘이럴지도 몰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실제 지금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확실과 연결된 가정의 상황과 사실적 정보에 기반한 현재 상황을 분리해서 현재에 더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결국 솔루션입니다. 내가 무엇에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마음의 고통이 실제 현실적인 정보에 근거한 불안인지, 무작정 부정적으로 생각을 이끌고 가면서 생긴 불안인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야 하겠습니다.

Q2: 암 치료가 끝났는데, 더 쉬는 게 좋을까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A: 참 어려운 고민이죠. 다만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쉬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돌아가야 할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그게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피하다 보면 적응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커지죠.
다만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치료를 마친 다음 더 쉬고 싶어도 바로 아이를 돌봐야 하고, 집안일을 챙겨야 하며,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 삶이라는 현실 속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들어가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간의 버거움, 불안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암 치료 이후에 쉬는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 중에는 여유시간 동안 나를 위해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힘듦에 대해서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의 여유를 오히려 불편한 불안이 침범해 들어오는 여유로 잘못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일이든 일상이든 다른 데 집중을 하면 불안이 줄어들게 돕니다.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힘든 순간에 그런 힘든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일과 쉼이라는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암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하는 거죠.
Q3: 암 경험자를 위한 모임 자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떨 때는 내가 암이라는 주제에서 거리를 두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A: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암 치료가 끝나면 그런 반응을 많이 경험하세요.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주변에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힘든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버텨 낸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 치료가 끝나면 이제는 뭔가 힘든 과정이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버거움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암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다음 단계를 기대하는 시선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질 때 그 부담이 우울감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 주기만 해도 일종의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내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경험자 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감정에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암과 관계없이 때로는 연대감이 때로는 소외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과도한 기대도 섣부른 실망도 잠시 접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이건 저희 ‘고잉 온 토크’에서 앞으로 더 준비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암 경험자의 모임도 암의 상태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 여성 직장인, 중년 남성 등으로 세분화해서 공감대 형성이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잉 온 캠페인’은 대한암협회와 올림푸스한국에서 암 경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고잉 온 토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와 암 경험자가 만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법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암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입니다. 영상 내용을 정리해 연재합니다.
암 경험자들의 사연과 고민을 보내주시면 ‘고잉 온 토크’ 영상과 글을 통해 다루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goingon.tal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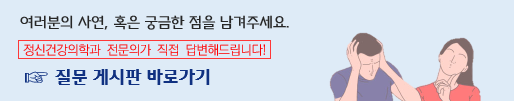 |
* * *
정신의학신문 마인드허브에서 마음건강검사를 받아보세요.
(20만원 상당의 검사와 결과지 제공)
▶ 자세히보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