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 (1)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내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대담을 시작합니다. 대담은 대한정신건강재단 정정엽 마음소통센터장과 한국적 정신치료의 2세대로 불교정신치료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전현수 박사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정엽: 저도 사실 천주교 신자인데, 불교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얕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리학의 뿌리가 불교에서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불교를 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전현수: 1985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전공의 2년차였거든요. 물론 저도 그전에 불교에 조금은 관심이 있었죠. 있었지만 불교를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1985년에 전공의 2년차 때 우연히 제 첫 번째 스승이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서른 살이고 그분은 오십 대 초반이었어요. 불교학과 교수였어요. 수행을 많이 한 교수였는데, 만나서 저한테 “뭐 하십니까?” 이래요. “전 정신과 전공의 2년차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불교는 괴로움을 없애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당신이 하는 정신의학도 정신적인 문제나 괴로움을 없애는 거 아니냐.”, “괴로움을 없애는 완벽한 시스템이 불교에 있다. 용어만 바꾸면 훌륭한 정신의학의 체계가 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죠. 자주 만나게 된 건 1985년 5월경이었어요. 이분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해 11월에 제가 그분의 공부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소위 말하면 가르침을 주고 질문을 주고 질문을 사유하고 가서 점검하는데, 11월에 이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에게서 12월에 세상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눈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 진리를 내가 평생 추구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세상의 원리를 저에게 적용했어요. 내 결혼생활, 내 외국생활, 내 의사로서의 생활을 반추해 보니까 내가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도 이해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불교를 어떤 종교로서 생각하게 된 게 아니라, 진리로서의 불교, 정신치료 차원에서의 불교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뭔가를 경험하잖아요. 경험해서 저한테 괴로움을 추리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잘 검토해서 불교 용어는 쓰지 않고 보편적인 거로 내가 만나는 환자한테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두 분야가 같이 간 거죠.
그러다가 2003년도에 명상하고 만나는 길이 생겼어요. 미얀마에 가서 한 달간 집중 수행을 한 거죠. 그때 한 달 동안 새벽 세 시에 일어나서 저녁 아홉 시 반 열 시쯤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관찰한 거예요. 관찰을 해보고 ‘몸과 마음이 이런 속성을 가졌구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느끼게 되면서 우리 환자에게 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편해졌죠. 정신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개인 분석도 4년 2개월 동안이나 받고, 나 자신이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고 순간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완전히 해결한 거죠.
해결하고 나중에는 불교에 초기 경전이 있어요. 불교는 크게 보면 초기 불교, 대선 불교, 티베트 불교가 있어요. 초기 불교는 내가 볼 땐 과학이에요. 검증된 진리죠. 초기 불교 경전을 ‘니까야(팔리어로 쓰인 불교 경전의 총칭)’라고 해요. 니까야를 읽으면서 좀 더 불교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면서 니까야에 있는 어떤 수행법대로 내가 철저하게 수행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마타와 위빠사나라는 수행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교와 정신치료가 가다가 같이 붙더라고요. 그 뒤 불교 정신치료라는 걸 하게 되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 정신치료의 시작은 1900년대 초반에 나타난 프로이트로 봐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불교라는 것이 2600여 년 전에 나타난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신치료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다.’, ‘어떻게 해서 병이 생겼다.’, ‘그래서 이 병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이 어떤 것이라는 바탕을 두고 세워진 거예요. 불교가 완전히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밝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학이에요. 관찰을 해서 밝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관찰하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불교 정신치료라는 것을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고 책도 쓰고 워크숍도 하고, 이번에는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라는 세계적인 학술전문 출판사에서 내 책이 또 출판되게 됐죠. 하여튼 그렇게 불교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정정엽: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데, 학문으로 배운 게 머리로는 알지만, 실생활에는 잘 쓰이지가 않잖아요? 아내랑 자주 싸우고 아들이랑도 트러블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선생님의 괴로움이 해결이 됐는지 이건 조금 나중에 묻는 게 좋을까요?
전현수: 우리한테 괴로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만큼 괴로운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내지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고 차이난만큼 괴로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잘못 처리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나 예방이란 것은 괴로움이 없으면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는 따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잘살고 마냥 전성기를 누린다면 누가 정신적인 병이 납니까? 살다 보면 힘들 때 그걸 잘못 풀고, 내 힘으로 못 풀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도 못 풀면,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면 정신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괴로움이 왜 오냐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와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 돌아가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면 그에 맞게 살면서 괴로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세상은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한 명이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거기서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요인은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몸에서도 일어나고 마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라는 게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몸이 어떤 거다, 마음이 어떤 거다, 잘 모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또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순간순간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정신의학도 공부하고 또 정신 치료자의 전문적인 과정도 밟고 불교도 해보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져서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몸의 괴로움은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한 대 얻어맞으면 얼얼하고 칼로 베이면 쓰라리고 피가 나요. 그렇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노력하면 없앨 수가 있어요. 몸은 절대로 못 없애요. 몸을 없앨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굉장히 노력하면 마음의 고통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야, 나 돈이 없어 힘들다.”라고 말하죠? 내 눈으로 볼 때는 돈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몸이 아파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면, 몸이 아픈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유로 힘들다.’라고 하면 그걸 견디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위에만 신경을 써요. 마음을 강화시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살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인데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우리가 장착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파일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살면 괴로움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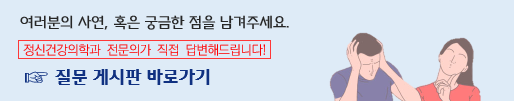 |
* * *
정신의학신문 마인드허브에서 마음건강검사를 받아보세요.
(20만원 상당의 검사와 결과지 제공)
▶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