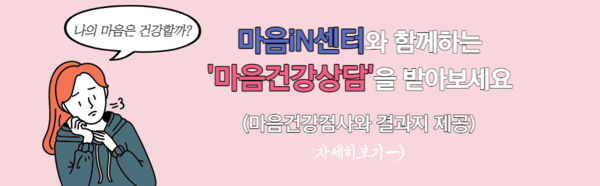29화 나의 사랑, 토분
어느 것이든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는 정말 중요하다.
커피 핸드드립을 배울 때, 나는 둥그런 고노kono 스타일의 드립퍼dripper로 배워서 아직도 고노 모양의 드립퍼를 보면 마냥 반갑다. 사진을 배울 때는 펜탁스pentax 필름카메라로 시작해서, 필름카메라를 꽤나 모았고, 여전히 디지털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요새도 필름카메라를 찾는 젊은 수요층이 있는 모양인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꽤나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주제넘게 ‘고생을 하시는군요, 파이팅!’하며 속으로 외치곤 한다.
식물을 시작할 때, 주로 양재 꽃 시장에 들렀다. 그곳이 분화盆花, Potted flowers가 많은 편이고, 분화상가 주변에 자재매장이 있었다. 초반에는 흙과 화분을 사가곤 했다. 인터넷으로는 시장에서 구매한 화분의 크기와 어울리는 화분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때 구입한 화분이 이탈리아 토분 데로마Deroma 였다. 그래서 나는 ‘화분=토분’으로만 알고 한참 식물 수발을 들었다. 토분이 올라갈 만한 탄탄한 선반을 구입했고, 다행히 선반은 토분과 흙에 물을 준 화분이 줄지어 있어도 든든히 지탱해주었다. 지금도 무리하고 있는 선반들을 보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토분의 특장점은 통기성이다. 통기성이 좋은 화분은 ‘숨을 쉰다’. 흙이 밀봉된 상태가 아니며, 물마름이 탁월하다. 모든 토분이 통기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색을 입히려고, 유약처리를 위해서 등의 이유로 통기성이 현격히 낮은 토분들도 존재한다. 모든 식물이 통기성 좋은 화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 듯이 식물과 환경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그 이후에 국내 여러 토분들을 알게 되었고, 사용해보기도 했다. 국내 화분이 근래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모든 브랜드가 각기 다른 지향점과 그에 따르는 시그니처가 있었다.
제네스포터리(Jeunesse pottery), 디어마이팟(Dearmypot), 스프라우트(Sprout), 카네즈센(Karnezcen), 가드너스 와이프(Gardners wife), 아뜨리움(Atrium) 블리스볼(Blissbowl등등 토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갈 때쯤에 두 갸르송(Deux garçons) 이라는 국내 토분을 알게 되었다. 두갸르송을 취급하는 서울 유일의 식물 가게가 우연히 단골 식물 가게여서 알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고, 통기가 잘 될 것 같았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집어서 사용해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화분이었다. 다시 찾아가 몇 개를 더 사왔다.



그렇게 두갸르송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좋은 것은 모두가 알아보는 법. 두갸르송의 인기는 순식간에 불이 붙어 번졌다. 그 불은 걷잡을 수없이 커져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수작업 치고도 꽤나 빠른 속도로 제작하는 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항상 5초 전쟁이 벌어진다. 인터넷 사이트 구매로 클릭! 하고, 5초에서 10초 내에 결제창으로 넘어가지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때에는 전날 밤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한 명당 구매 개수가 제한되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긴 줄에 섞여 기다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더 이상 선반에 놓인 화분을 둘러보며 ‘몇 개 사갈까?’ 하는 사치스러운 고민을 할 수 없어졌다.

어떤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지, 정말 중요하다.
정신과 상담일수록 더욱 그렇다. 나는 워낙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별다른 기대치가 없었다. 삐딱한 자세였고, ‘누가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면 듣지 않을 거야.’라고 단단히 마음먹은 상태였다. 운이 좋게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과한 리액션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워낙 기대치가 없었기에 감동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대개의 사람이 첫 방문한 병원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절실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절실한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듣고 싶은 말의 범위가 좁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죽겠는데 그런 사람을 앞에 앉혀 두고 무슨 낭만적인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지. 그런 경험은 더욱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경험에서 가장 힘 빠지고 어려운 점은 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녹음기를 틀어 놓고 듣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내가 회상하며 일일이 말을 해야 한다. 곱씹고, 회상하며 다시 마음을 어지럽혀야 한다. 매우 지치고 힘든 일이다. 마음과 몸이 모두 지친다. 그 사실을 공감하기에 나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권한다. 의사도 사람이고, 나를 만날 때 그들은 직장에 나온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권태나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을 걸러내면 된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기준점을 만들면 된다. 물론 엉망진창으로 1-2분 컷으로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병원은 피하기를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곳은 약 제조기와 다를 바가 없다.
소용돌이 같은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정신과 선생님은 입원 치료를 권하셨다. 나에게 정신과 입원이란 ‘진정으로 심각한’ 정신과 환자들이 찾아가는 곳을 의미했다. 그 속마음에는 선입견과 편견도 있었다. 아마 조현병에 걸린 환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온 것 같다. 그곳에서는 팔, 다리를 묶어버리는 강제성과 잠이 오는 약을 자주 주는 상상들을 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란 생각이 동시에 들었지만 강하게 드는 거부감은 어쩔 수 없었다. ‘날 왜 보내려고 하지?’, ‘손 떼고 싶으신 가?’ 등의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제의를 하실 때마다 에둘러 거절했다.
그러다 증상이 점점 심각해졌다고, 내 모든 감각들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홀로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먼저 입원 치료에 관한 정보를 묻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선생님이 생겼다.
병원은 내 편협한 생각과는 다르게 평범했고, 3인실 환자 중 사실 내가 가장 은둔형이었다. 팔, 다리를 묶는 일은 인권문제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주치의선생님이 거의 매일 나를 찾아와 긴 상담을 해주곤 했는데, 이때 주치의선생님은 별 유도 질문도 크게 없었는데, 나는 남에게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아버렸다. 그리고 말라버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새로 만난 교수님과 주치의 선생님이 번갈아 나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모양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기법(?)을 쓴 것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길다면 꽤 긴 시간 동안 나의 치료기간은 마무리되었고, 나는 이제 그 병원을 떠나왔지만 이제 심각해지면 언제든 병원을 찾아 입원을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의 비상구 같은 곳이 생긴 셈이다. 나에게 ‘잘한다’, ’훌륭하다’라고 거듭 말씀해주신 덕에 글을 쓸 수 있었다. 게다가 손과 발이 닳도록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언제나 친절하실 수 있을까.
어느 것이든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는 정말 중요하다.
그 시작이 그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주 2회 수, 금요일 글이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