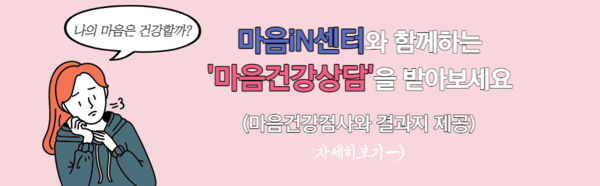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 감정의 싱크홀
[정신의학신문 : 신림 평온 정신과, 전형진 전문의]
최근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배우 차승원과 김성균이 출연하여 유머, 재난, 감동을 골고루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재인 싱크홀은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 나오는 한강 괴물처럼 판타지가 아니다. ‘해운대’, ‘투모로우’처럼 재난 영화에 가깝지만, 조금 더 특별한 지점이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일어날지 모르는 도시재난인 것이다. 그렇다면 ‘싱크홀’의 어떠한 지점이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걸까?
싱크홀(Sink Hole)은 말 그대로 땅이 꺼지면서 생기는 구멍을 말한다.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석회암 지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무리한 도시 개발 등의 문제로 도시에서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도심에 갑자기 출연했다는 이유로 싱크홀은 뉴스에 나오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다. 싱크홀은 이에 딱 들어맞는다. 복잡한 도시, 출근길 한가운데 갑자기 뻥 뚫린 구멍을 상상해보라.
가까운 곳에 도사린다는 점,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공포스럽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주목하고 싶은 싱크홀의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 지반이 가라앉아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것이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나를 잠식하고 있는 우울, 무기력, 부정적인 감정과 같이.
감정의 작용 또한 싱크홀의 발생과 비슷하다. 마음속에서 지반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 본인도 무너지기 직전까지 모를 수 있다.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있거나, 자신의 상태를 모른 척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렇게 작은 균열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고 거대한 구멍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갑자기’일까?
상담 시, 정신과 의사나 상담심리사가 감정을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음의 병은 외계인의 침공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깊은 땅속 지반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감정은 마음 속 균열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준다. 하지만 처음 병원에 방문한 사람은 자꾸만 기분이나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에 경계하거나 의아할 수밖에 없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말을 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말해야 하는가?
우선은 우리가 감정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관적인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구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기 힘들어져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의 감정에 둔감하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균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다.
균열을 언어로 표현해야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균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말이다. 언어는 감정의 명확성을 획득해주기 때문이다.
정서주의 치료의 대가인 캐나다의 요크 대학교수 Greenberg는 4단계 정서 표현 과정 모델을 정립했다.
1단계는 개인 내적의 정서를 경험하는 단계로, 각성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한다.
2단계는 정서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3단계인 정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3단계는 자신이 경험한 정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4단계는 경험한 정서가 표현할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정서 표현 또는 정서 표현 양가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가운데 3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1, 2단계는 3단계에 의해 부적응적이기도 하고, 적응적이기도 하면서 4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연구를 보면 언어와 감정의 연관성을 더욱 잘 살펴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Swinkels와 Giuliano는 정서 인식에서 정서의 명명화(mood labeling)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정서의 명명화가 높게 나타난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이에 만족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명명화가 낮은 대학생들은 낮은 자존감과 신경질적 성향(neurotic tendencies)을 보이며, 자신의 기분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분에 압도되기도 했다.
상처 입은 마음과 싱크홀은 갑작스럽게 공동이 뚫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균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아득히 깊은 구멍 속을 바라보고 있으면, 본인에게 벌어진 일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는지, 왜 말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이다. 용기 내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버무려왔던 감정 상태를 제대로 마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선행된다면, 감정의 싱크홀이 생기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