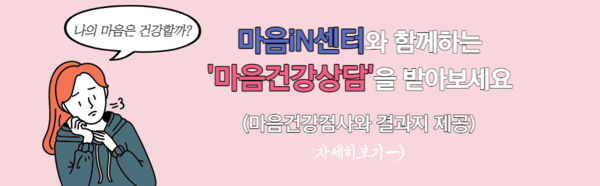불면증과 과수면
의학박사 이광민의 [슬기롭게 암과 동행하는 방법] (17)
[정신의학신문 : 마인드랩 공간 정신과, 이광민 의학박사]
불면증과 과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수면은 일상생활의 기초이며 건강한 삶의 바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불면증과 수면 습관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암 경험자들의 실제 질문을 바탕으로, 더욱 실제적인 방안에 접근해보겠습니다.
Q1. 저는 우울감이 심할 때 불면이 아니라 온종일 잠이 쏟아져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A. 실제로 전체 불면증의 60~70% 정도는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공존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 불안, 기타 정신적인 질환에 불면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과 같은 공존 증상을 조절하면 수면이 자연스레 좋아지게 됩니다. 불면증과 과수면 상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밤에 잠은 들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회복의 정도가 떨어져 선잠을 자듯 낮에도 수면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울증은 우리 몸의 기력을 다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축 처지는 경우 앉아있거나 서 있기보다 누워있고 싶게 됩니다. 잠이 든 것도 아닌데 낮에 누워있는 것을 우리 뇌는 잠자는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낮에 잠을 잤다고 인식하니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낮에 누워서 지내지 않으려는 습관은 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이죠. 또한 우울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의 약, 어떻게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Q2. 암 경험 이후 가끔 불면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면제는 거부감이 들어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 멜라토닌이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A. 우리의 몸 안에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있어 멜라토닌이 제일 중요한 물질이긴 합니다. 멜라토닌이란 뇌 안의 ‘송과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멜라토닌의 흐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잠을 자려고 하는 늦은 저녁 시간대부터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며, 새벽에 쭉 유지되다가 아침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잠을 자려는 신호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잠에서 깨게 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운동이나 햇빛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의 빛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깨지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스마트폰 보는 것 자체를 경계하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잘 때 스마트폰을 보면 눈에 빛이 들어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까닭입니다. 즉, 우리 몸 안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수면 습관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먹어서 흡수되는 멜라토닌은 몸 안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몸 안에서 물질이 분해되는 속도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는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멜라토닌은 반감기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멜라토닌은 30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고, 두 시간 내로 몸 안에서 대부분 분해되어 버립니다. 일반적인 멜라토닌은 우리 몸 안에 멜라토닌 분비의 시작을 맞춰주는 정도의 가벼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고 싶어 하는 시간, 예를 들어 9시나 10시에 멜라토닌 약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멜라토닌이 인위적으로 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뇌는 그 시간 때에 맞추어 멜라토닌을 분비하려고 노력합니다. 멜라토닌 약 복용은 우리가 자고자 하는 시간에 잠드는 것을 세팅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 끊는 방법
Q3. 수면제를 꽤 오랜 시간 복용해왔는데, 약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아예 못 자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수면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A. 수면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복용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수면제는 생물학적인 의존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심리적 의존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거의 곧바로 잠이 들고, 일어날 때도 상당히 개운함을 느낍니다. 통상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잠을 훨씬 편하게 잘 잡니다. 그렇다면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본인이 정상적인 수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수면제 의존성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잠이 들 때 20~30분 걸리는 게 맞고, 자다가 1~2번 정도는 잠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10분 혹은 15분 내로 곧 잠이 들고 눈을 뜨면 아침입니다. 즉, 수면제를 복용하다 보면 약을 먹고 빨리 잠들고 중간에 전혀 깨지 않는 것이 좋은 수면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의존이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또한 수면제 복용으로 잠이 들었을 때, 의식을 잃은 채 행동하는 부작용이 종종 있습니다. 의식은 약으로 약해졌는데 실제로 잠은 들지 않았을 때 그러합니다. 기억만 살짝 나가 있는 상황에서 행동하고, 그 이후에 잠이 들게 됩니다. 가볍게는 수면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중에 음식을 먹거나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기억을 못 하는 정도지만, 심한 경우 외출을 하거나 운전을 하고도 기억을 못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수면과 관련된 약물치료를 했다고 해서, 평생 수면 관련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합니다. 이미 약을 먹게 되었으니, 마치 고혈압약처럼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수면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습관을 지니려고 노력했는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非)약물적인 부분에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본인이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잠잘 수 있는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을 잘 만들면서 의존성이 약한 약으로 바꾸면서 약물을 아주 천천히 줄여나간다면 약물치료에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잘 수 있는 힘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회차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불면증의 원인과 수면습관]
‘고잉 온 캠페인’은 대한암협회와 올림푸스한국에서 암 경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고잉 온 토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와 암 경험자가 만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법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암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상 내용을 정리해 연재합니다.
※ ‘고잉 온 토크’ 강의 직접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