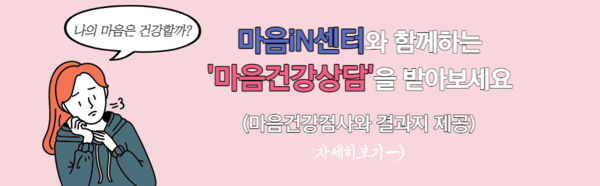존재를 부정하는 '수치심'
[정신의학신문 : 서대문 봄 정신과, 이호선 전문의]
당신은 언제 수치스러움을 느꼈는가? 좋아하는 상대 앞에서 우스운 자세로 넘어졌을 때?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 앞에서 말실수했을 때? 사람들 가득한 광장에서 뺨을 맞았을 때? 모두 수치스러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예시일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수치스러운 기억 하나쯤 가슴속에 품고 산다. 사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화도,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이 끔찍한 수치심으로 흉터 질 수 있다. 수치심을 느꼈던 때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수치심은 부끄러움, 창피함과는 다르며 자기 자신의 본질까지 파고드는 무서운 감정이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굉장히 씩씩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타인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대학교 수업에서 발표하던 날 상황은 달라졌다. 교수는 친구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망신을 주었다.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표정과 말투에 대한 모욕이었다. 평소에 잘 동요하지 않던 친구는 적잖이 당황했는지 눈동자를 굴리며 어쩔 줄 몰라했다. 그 때문에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친구는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 가서 울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수치스럽다고 했다.
그 친구와 만나면 아직도 그때의 일을 회자하며 교수를 욕한다. 하지만 아무리 거친 욕을 해도 친구의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말이다.
비단 성인이 되어서 뿐만이 아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자. 형제가 보는 데서, 친구가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훈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어떤 이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할지 모른다. 이상하게, 다른 기억보다도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기억은 유난히 더 잘 기억되는 듯하다. 왜일까? 우리는 언제부터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만 2살부터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 ‘수치심’은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다. 여기에는 당혹스러움, 굴욕감, 치욕, 불명예 등이 포함된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노출되고, 경멸받는 경험들이 수치심 발생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University of Wisconsin–Stout의 Cook D. R. 에 의하면 유아 초기에 형성된 수치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는다.
수치심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고, 실수를 허용함으로써 타인과 자기 통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수치심을 지니고 있는 경우,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나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실패자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을 비판함으로써, 존재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다.
자신이 느낀 것과 비슷한 수치심을 아이가 경험하게 하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아이가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에는 ‘수치심’이 자리한다.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곧, 자기 존재를 창피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훈육은 피할 수 없다. 아이가 훈육의 현장을 피하고 싶을 정도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끔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John Mordecai Gottman의 감정 코칭에서 수치심 없는 훈육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1. 비판보다는 불만을 이야기할 것.
불만은 그 사람의 가치를 비판하는 대신 특정 행동이나 잘못된 이유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항상’이나 ‘꼭’과 같이 영속을 뜻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
현재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낙인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3. 성격적 특성을 공격하지 않을 것.
성격은 존재를 공격받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우리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자.
위의 감정 코칭을 적용하여, 쉬이 할 수 있는 말을 수정해보자.
1. 넌 꼭 과자를 다 먹고 봉지를 아무 데나 두더라. 게을러서 원. -> 과자 봉지를 바로 치우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부스러기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게 돼.
2. 왜 자꾸 동생을 때리니? 왜 그렇게 공격적이야? -> 네가 동생을 때려서 속상하구나.
중요한 점은 특정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존재를 부정하는 수치심이 아니라,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죄책감 또한 고통스럽지만, 실패나 잘못에 대해 행동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다른 개념이다. 죄책감은 특정 행동에 초점을 둔 것으로, 후회나 가책을 불러일으키고 타인에게 자신이 미친 영향을 염려하게 만든다. ‘수치심(羞恥心)’은 문자 뜻 그대로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이다. 죄책감과는 달리, 자기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며 삭제해 버리기도 한다.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공격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딱 하나 제대로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일 것이다. 수치심은 그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