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람은 멀리하는 게 맞는 거죠?
내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 (4)
대담은 대한정신건강재단 정정엽 마음소통센터장과 한국적 정신치료의 2세대로 불교정신치료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전현수 박사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정엽: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쁜 사람은 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전현수: 그렇죠. 적당히 해야 합니다.
정정엽: 관계를 아예 끊는 건 아니고요?
전현수: 절대로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조금 싫다고 해서 끊잖아요? 그러면 자기 옆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무척 많아요. 회사 안에서도 유달리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왠지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걸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같은 배를 탔잖아요? 서로 잘 다닐 수 있도록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대로 먼 사람은 먼 대로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 가까운 사람도 멀어질 수 있고, 먼 사람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도 관계가 있겠죠. 정확하게 봐서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나한테 손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에요. 몸과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특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순간적인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고정된 조건이 아니고요. 항상 인과의 법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싶다 하면 그에 맞게끔 훈련을 해야 해요. 몸을 잘 만들고 싶으면 헬스를 해야 하듯이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정엽: 세상은 생명을 가진 존재와 가지지 않은 존재로 나뉘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나와 남으로 나뉘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와 생명을 가지지 않은 존재가 어떤 법칙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관찰하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기에 이것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현수: 맞습니다.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가는 장치를 가져야 해요. 잘 살아갈 수 있는 장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자연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관찰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든 누가 말하는 대로 살든 몸과 마음의 속성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2003년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한 달간 명상을 했어요. 그때 했던 명상이 보행 명상과 일상생활 관찰이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종일 앉아서 관찰하고 걸어가면서 관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하는 거였어요. 그걸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몸이 이런 거구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보니까 ‘내가 몸과 마음에 맞지 않게 하면 병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몸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생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생명 활동이 일어나요. 제가 참 놀란 게 의대 다닐 때 생리학 시간에 보면 세포에서 우리가 필요한 전해질을 운반하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소듐 채널, 칼슘채널 등. 그 정도로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생명 활동이 일어나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성은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생명 활동 자체가 좋고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중립적이에요.
정정엽: 생명 활동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하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온전히 중립적인 거란 말씀인가요?
전현수: 그렇죠.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추울 땐 추울 만한 조건이라서 추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든 그건 일어날 만한 것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립이라고 봐야 해요.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몸은 잘 관찰해보면 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루가 마음대로 옆으로 갑니까? 누군가 들어서 날라야 가잖아요. 정확하게 몸도 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생명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만요. 저도 예전에는 발과 다리가 그냥 걸어 다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보행 명상을 하면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걷는 걸 관찰해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발을 들고 가고 놓는 거예요. 이걸 잘 관찰하고 숙달하면 걸어가면서 발을 들 때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들지 않으려 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놓는 거예요. 그걸 잘 관찰해보니까 몸이라는 건 의도가 움직이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의도란 정신작용이잖아요. 몸은 그냥 자루처럼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최면 원리도 한동안 했었거든요. 최면도 암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 하는 의도에 따라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보면 합장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만으로 손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의도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과학적으로 잘 관찰하면 내부적으로는 생명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거시적으로는 자루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게 몸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가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첫째 이 생명 활동에 있어서 반응해요. 반응은 세 가지예요. 몸의 속성은 중립이라 했잖아요.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중립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에 있어서 우리한테 영향이 와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그냥 오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짜증 내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생명 활동이에요. 이 생명 활동에 대해서 왜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을 수 없어?’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소화력이 좋구나.’, ‘지금 뭐 먹자고 하면 더 맛있겠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반면에 담담하게 ‘내 몸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 중립적이겠죠. 잘 보면 몸 자체가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언제나 우리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가요.
두 번째는 아까 가만히 있는 몸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의도가 몸을 움직여요.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보행 명상처럼 잘 관찰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를 관찰하는 방법 중에 삼매(三昧, 순수한 집중을 통하여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이용하는 관찰이 있어요. 선정(禪定, 생각을 쉬는 것)도 삼매의 일종인데,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집중해 있는 상태에요. 우리 마음이 확고하게 대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눈이 열려요. 우리의 눈, 코, 혀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보여요.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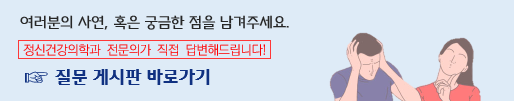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