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기피증은 뇌의 문제?
[정신의학신문 : 온안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저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듣는 표현 중 하나는 바로 '대인기피증'이다. 명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대인(對人). 즉 사람을 대하는 것을 기피하는 증상을 통틀어서 막연히 대인기피증이라고들 표현한다.
사람을 피하는 이유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기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간섭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등등 많은 이유가 있다.
또 그 이유들마저도 각각 또 다른 이유들로 분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생각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 나를 욕하고 있다는 생각, 나를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 나의 약점이 들킬 것 같다는 생각,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조롱할 것 같다는 생각,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하고 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하고도 복잡한 마음들이 뭉쳐서 대인기피-즉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지게 되곤 한다. 인간은 분명 사회적 동물이라 했건만, 남들이 말하는 그 사회적 본능을 거스른 채 홀로 있고 싶어 지고 고독을 찾아 움츠러들게 된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다양한 심리적 원인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세한 사연과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긴 소파에 누워 무의식을 찾아 길고 먼 여정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의 머릿속을 채우는 자동적인 생각과 감정을 파헤치기 위해 기록지를 작성해나가 볼 수도 있다.
"몰라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요."
"그냥 저는 원래 그런 거 같아요. 언젠가부터 혼자 있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의 '그냥'과 '원래' 속에 숨어 있는 '나도 모르는 나'를 찾아가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대인기피증에 대한 정신의학적 접근에서는 위와 같은 심리적인 분석과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인기피를 '사회성'의 결여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성'을 결정하는 뇌 속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호르몬은 바로 '옥시토신'이다.
옥시토신은 출산기 자궁수축과 수유기 젖분비를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하지만 옥시토신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바로 '사랑의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은 모성애를 느낄 때, 귀여운 것을 보거나 따뜻한 애정을 느낄 때, 플라토닉한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하다.
옥시토신이 타인에 대한 애정을 느낄 때 분비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풀고 다가가는 과정에도 옥시토신이 관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생존의 본능을 거두고,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애정의 본능이, 아니 애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호감의 무언가가 필요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옥시토신은 사회성의 근본을 이루는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얼마 전 한 유명 학술 잡지에 옥시토신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동물실험 결과가 실렸다. 그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옥시토신을 단순히 혈액이나 뇌에 주입한 것이 아니라 뇌 속 어느 특정 한 부분에 겨냥하여 주입했다. 정확히 그 부위에만 옥시토신이 작용할 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진은 쥐의 뇌 속 측좌핵(Nucleus Accumbens)이라는 곳에 약물 주입 주사기를 직접 설치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측좌핵은 보상(Reward)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뇌의 자체적인 보상 시스템이 바로 측좌핵에 있다. 연구진은 이 측좌핵 내에 존재하는 옥시토신 수용체(Receptor)가 자극되는 양상에 따라 쥐의 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관찰했다. 즉, 연구진은 사회성을 옥시토신이 주는 보상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타인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해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따라서 사회적 접근은 그 위험을 상회할만한 더 큰 보상을 예상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말이다. 측좌핵을 포함하는 보상회로가 작동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얻게 되는 보상은 최종적으로는 물론 생존과 번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주는 단기적인 보상은 관계에서 오는 호감, 애정, 따뜻함 같은 모호한 감정이며, 이는 다름 아닌 옥시토신의 감정이다.
연구진은 측좌핵에 약물 주입 바늘을 설치한 쥐들이 다른 낯선 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며 사회적 적응 양상을 관찰하였다. 연구진은 사회성을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하나는 '사회적 접근(social approach)'으로 낯선 쥐 옆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며 측정하였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계(social vigilance)'로 낯선 쥐를 인식하고 계속 관찰하지만 근처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시간을 측정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관찰한 것은 측좌핵에 옥시토신이 줄어들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였다. 연구 결과, 설치한 바늘에 옥시토신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주입했을 때에 쥐들은 '사회적 접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낯선 쥐가 나타나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사회적 경계성이 뚜렷하게 커지지는 않았다. 쥐들은 마치 낯선 쥐가 없다는 듯 행동하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인기피증이 있긴 하지만 딱히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하지는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지만 고독을 즐기는 듯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변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대인기피 상태에서 옥시토신이 측좌핵에 늘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였다. 먼저 연구진들은 쥐들에게 직접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주며 대인기피증 상태로 만들었다. 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계성과 공격성이 강해지며 낯선 쥐와의 접촉에 민감해지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기피증에 빠진 사람들과 같다고 가정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쥐들의 측좌핵에 옥시토신을 주입하자 '사회적 경계'도 감소하고 '사회적 접근'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회불안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놀랍게도 옥시토신의 이러한 사회 불안 감소 효과가 단순히 쥐에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람에게도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을 때에 사회불안, 발표 불안 등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 발표되었던 바 있다. 그래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코에 옥시토신을 뿌려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형식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아쉽게도 특정 상황에서만 효과가 있었고, 오히려 옥시토신을 투여하자 반대로 사회불안이 악화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 임상에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옥시토신의 전반적인 작용이 아닌 측좌핵에 집중된 작용 효과를 관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성과 사회불안의 기전에는 측좌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과정은 옥시토신이 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또한 옥시토신의 작용을 '사회적 접근'과 '사회적 경계'로 나누어서 관찰함으로써 대인기피증이라고 이름 붙은 증상의 서로 다른 면모를 실제적으로 증명했다는 바 역시 의미 있다. 같은 대인기피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경계상태와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무관심한 상태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번 연구 결과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아마 측좌핵과 별도로 또 다른 형태의 회로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옥시토신과 사회성 사이의 비밀은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혹자는 자폐장애 환자들에게 결여된 사회성 역시 옥시토신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이 최종적으로 대인기피증의 치료로 이어질 때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성의 본성이 다름 아닌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사실은 어딘지 모르게 뭉클해진다.
루소가 말했듯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서로의 안위를 위한 건조한 '계약'에 지날지 모른다. 그러나 생물학이 루소의 그것과 조금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차가운 계약 아래에는 좀 더 따뜻한 사랑과 애정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다.
참고자료
Social approach and social vigilance are differentially regulated by oxytocin receptors in the nucleus accumbens, Neuropsychopharmacology, 2020 Aug;45(9):1423-1430.
Baumgartner T, Heinrichs M, Vonlanthen A, Fischbacher U, Fehr E. Oxytocin shapes the neural circuitry of trust and trust adaptation in humans. Neuron. 2008;58:639–50.
Domes G, Heinrichs M, Michel A, Berger C, Herpertz SC. Oxytocin improves “Mind-Reading” in humans. Biol Psychiatry. 2007;61:731–3.
Calcagnoli F, Kreutzmann JC, de Boer SF, Althaus M, Koolhaas JM. Acute and repeated intranasal oxytocin administration exerts anti-aggressive and pro-affiliative effects in male rats. Psychoneuroendocrinology. 2015;51:112–21
DeWall CN, Gillath O, Pressman SD, Black LL, Bartz JA, Moskovitz J, et al. When the love hormone leads to violence: oxytocin increases intimate partner violence inclinations among high trait aggressive people. Soc Psychol Personal Sci. 2014;5:691–7.
Shamay-Tsoory SG, Fischer M, Dvash J, Harari H, Perach-Bloom N, Levkovitz Y. Intranasal administration of oxytocin increases envy and Schadenfreude (gloat-ing). Biol Psychiatry. 2009;66:86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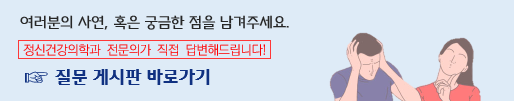 |
* * *
정신의학신문 마음건강검사를 받아보세요.
(상담 비용 50% 지원 및 검사 결과지 제공)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