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일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 (2)
대담은 대한정신건강재단 정정엽 마음소통센터장과 한국적 정신치료의 2세대로 불교정신치료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전현수 박사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정엽: 세상을 살아가기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남들이 끼어들어서 차이가 좀 더 커지기 때문이며, 몸과 마음의 속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잘못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현수: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음모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말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사랑이 있다.’ 이런 건 빠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처럼 작은 것도 있고 우리와 같은 것도 있어요. 하여튼 우주를 포함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물리법칙이나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볼펜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딱 떨어지지 떨어지기 싫다고 옆으로 가진 않아요. 그렇듯이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크던 작던 다 법칙대로 움직여요. 따라서 우리가 리모컨으로 먼 화성에 있는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가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물 활동을 해요. 자극이 오면 나름대로 반응을 하죠. 물론 생명을 가진 것도 죽으면 생명을 가지지 않은 존재하고 같겠죠. 죽은 시체는 물리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는 크든 작든 외부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도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기 속성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저기 저분 같으면 저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것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와 남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은 생명을 가졌지만 내가 아닌 남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나일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남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에 둘러싸여 있지만, 다른 존재가 들어가면 그 존재가 중심이고 나는 바깥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은 무수한 중심이 있고 외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중심으로만 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나로서 가장 소중하고 다른 존재는 그 존재가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까 공평한 마음이 중요해요. 정하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남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연이나 사물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거기서 자세히 보면 나와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법칙이 있어요. 또 나와 남 사이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상은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보지 못해요. 나와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사이의 법칙은 뭐냐 하면 나와 생명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있어요. 예를 들면 호흡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어쨌든 여기서 뭘 빨아들여 필요한 걸 작용해서 뿜어내죠. 나와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정정엽: 조금 다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현수: 예를 들면 내가 겨울에 이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의 온도가 나한테 뭔가 작용을 하겠죠. 내가 주인이니까 1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하 2도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연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은 하죠. 예를 들면 여름이었으면 문을 열 수도 있고 에어컨을 켤 수도 있죠. 하지만 누가 켜든지 똑같이 켜면 똑같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사이는 물리법칙에 따라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나와 남 사이에는 계속되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상호작용이 왜 있느냐면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거나 조금 게을리하면 괴롭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내가 남을 필요로 하니까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으면 남을 왜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죽지 않고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다른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기와 엄마라고 보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배고프면 울어야 하잖아요? 불편해서 울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때 상호작용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죽지 않고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자연에서는 자연법칙과 물리법칙에 따라 뭔가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다른 생명을 가진 것과 상호작용할 때는 일 대 일이 일 대 다가 되고, 다 대 다가 되고, 다 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리를 설명해야 하니까 일 대 일로 한다면, 내가 남에게 하는 행동은 자세히 보면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봤을 때 ‘아, 나도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은 내가 좋아서 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어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때는 이 상대방한테서는 나한테 순조로운 게 올 거예요. 하지만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안 좋으면 뭔가 좀 저항적인 게 올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칙화하기 위해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것을 ‘선(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이나 철학에서 쓰는 선을 가만히 보면 다 이런 개념이에요. 선이고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안 좋으면 ‘악(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어떤 행위에는 즐거운 결과가 와요. 뭔가 순조로운 결과가 와요.
그런데 악한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좋은데, 남이 안 좋으면 괴로운 결과가 와요. 그래서 한자말로 쓰면 ‘선인낙과(善因樂果)’라고 해요. 선한 원인에는 즐거운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 반대는 ‘악인고과(惡因苦果)’에요. 악한 원인은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의 법칙이에요.
이걸 내가 한동안 관찰했어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에 따라 세상은 다 돌아가요. 그러나 이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죠. 자기만의 어떤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욕심은 절대로 안 돼요. 욕심을 내다가 안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화를 내요. 화내면서 다시 또 새로운 무지로 출발해요. 그래서 무지와 욕심과 성냄을 반복하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레지던트 2년 차에 이걸 깨닫고 나서 아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아내에게 맞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이걸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가 옳다 그르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그 사람 잘되라고 한 말인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남이 판단하는 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판단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우선은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공존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온난화라고 걱정을 하죠? 자연에 맞지 않는 걸 엄청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지구와 하나로 뭉쳐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생명 가진 거 있잖아요? 사람을 포함해서 개든 동물이든 그걸 볼 때는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나쁜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판단해요.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남과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봤던 또 우리가 접촉했던 무수한 사람들 속에 들어 있어요.
잘 들어 있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죠. 정치인 같으면 선거에 이기겠죠. 트럼프는 안 좋게 들은 사람이 많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살고 싶으면 이쪽에 잘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잘 파악해야 해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남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같이 잘 살아가야 돼요. 남을 잘 파악하는 게 공감이거든요.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런 원리에 맞지 않게 살면 괴로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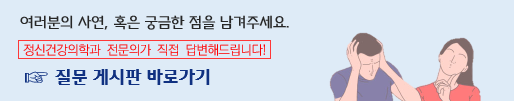 |
* * *
정신의학신문 마음건강검사를 받아보세요.
(상담 비용 50% 지원 및 검사 결과지 제공)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