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신문 : 허지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A는 면담 중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 말했다.
"제가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렇게 행동하고. 집에서의 제 모습과, 친한 친구들한테의 제 모습과, 직장에서의 제 모습이 또 달라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어요. 너무 지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냉기를 쐬면서 서있던 적도 있었어요. 내가 쓴 가면의 온도를 떨어트려서 제 얼굴에서 떼어내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으려 하다 보니 내가 여러 모습들로 분열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조용한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한 듯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인지 말은 견고했고, 또 그만큼 생각도 완고했다.
A는 실제로 집에 있을 때는 한없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다가, 집 밖에 나서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 그러다가도 엄마나 동생 등 가족과 있을 땐 꼭 '미친 사람'처럼 굴며 짜증을 내어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초등학교 이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모든 일을 혼자 알아서 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 대신 스스로와 동생을 챙기는 과정에서 한 번도 엄마의 칭찬을 들은 적도, 인정받은 기억도 없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은 ‘한 번도 높아질 수가 없었으며’, 다만 엄마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뭐든 열심히 하다 보니 성취 수준이나 대인 관계는 객관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편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어떤 때엔 분위기도 띄우려 사람들에게 실없는 농담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그걸 보고 자신도 기분이 갑자기 좋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마법에서 풀린 비참한 꼴이 되어 종종 술에 의존해 잠을 청해야 했고, 주위 사람들도 언젠가 자신의 본모습을 알아차려 환멸을 느낄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다.
최근에는 귀가하여 손을 씻다가 문득 자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자신의 모습에 겁이 나 심리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꼭 매일 연기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존감도 진실함도 없이 이렇게 거짓으로 사느니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또 어떤가 싶고 그래요."
<뇌가 당신에게: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에 대해>
우리의 자존감(self-esteem)을 낮아지게 하는 요인은 도처에 산재해있고 우리의 뇌에 오래도록 상흔을 남깁니다.
다양한 연구들은 주양육자의 방임과 무관심, 학대, 병리적인 심리적 침투와 조종, 개인의 저조한 사회적/직업적 성취,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가정불화, 집단 따돌림, 약자에게 가학적인 미디어의 논조와 사회적 분위기, 특정 집단에 대한 구분 짓기와 차별, 이와 관련한 외상적 경험 등 전 생애의 단계 마디마다 그 위험요인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이런 학대와 트라우마의 경험은 우리의 자기개념이나 정서/인지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회백질 부피를 유의하게 감소시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예측 가능하게도, 위의 부정적인 삶의 사건들 중 어느 하나도 뇌의 실제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은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강박장애와 불안장애,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역기능적인 사회 기술, 과잉한 성취지향성 혹은 정반대로 빈약한 성취욕구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자존감이란 용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지만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William James가 1890년대 처음으로 심리학적 개념으로 끌어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취 수준’을 ‘개인의 목표치’로 나눈(÷) 비율 공식으로 간단히 정의했지요.
즉, 자존감 = [성공 수준÷야망]
높은 자존감을 위해서는 성공 수준을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방법이라 제안했죠.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 희생의 미덕보다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는 트렌드에 따라, 그리고 (현재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낮은 자존감은 낮은 학문적 성취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당시의 섣부른 추측에 따라, 자존감의 상승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와 90년대, 자기계발서 작가들의 선무당식 진단에 따라, 개인의 저조한 성취, 대인관계 문제, 심리적 문제는 모두 낮은 자존감에 기반한다는 마구잡이식 조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개인의 자존감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대학가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문화와 사회를 아우르는 강력한 추세였고, 이는 심지어 3,4세의 영아에게까지 번져, 영아 자존감을 측정한다는 검사지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성취와 실패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개인 자존감 문제를 추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절대적 수준의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지각하는' 본인의 자기 가치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높은 자존감이란 '좋은 지도교수', 혹은 '손이 안 가는 아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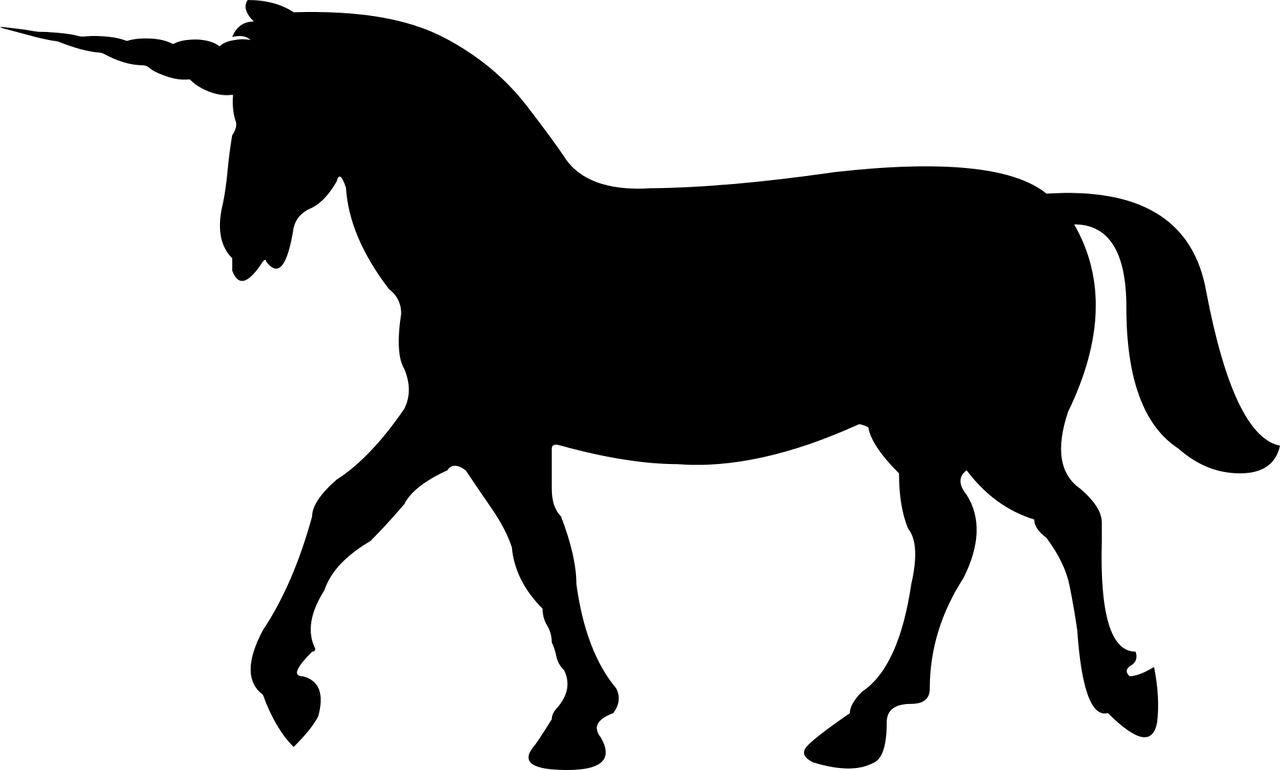
자존감 높은 사람, 주위에 누가 있나요? 실존하나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주위에... 너무 많지요.
물론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겠죠. 그 사람들도 다들 매일 요동치는 자존감을 가지고 지냅니다.
그들도 어떤 날은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고 (아마 이런 때 당신을 만났겠죠), 어떤 날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태 자존감(state self-este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다들 너무나 유동적이면서 낮은 자존감을 부여잡고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가 만든 자존감의 허상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도대체가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대-충’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낮다고 느껴지는' 자존감을 가지고 지냅니다.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의 태도가 전환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평가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지요.
UCLA 심리학 · 정신의학 · 생물행동과학과 교수이자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을 창간(했으나 논문 질 관리에 실패하여 초기의 명성을 잃고 있는)한 대표적인 신경과학자 Matthew D. Lieberman의 저서,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은 '청중의 반응에 반응하는 뇌'라는 내용을 가장 첫머리에 싣고 있죠.
실제로 칭찬 자체는 굉장한 쾌락적 보상이며, 우리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기분 좋은 물리적 접촉(touch)과 같은 보상적 자극에도 반응하는 뒤쪽뇌섬엽(posterior insula)이라는 뇌의 영역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단서들, 즉 기분 좋은 심리적 접촉에 활성화됩니다.
또한 확산자기공명영상(dif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는 기법으로 자존감이 일정 기간 동안 높아진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안쪽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과 배쪽선조체(ventral striatum) 간 백질회로(white matter pathway)의 연결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의 경우 이 연결성이 저하되어 있고요.
사실 이 배쪽선조체라는 뇌의 구조물은 뇌의 보상회로에 속하는 영역으로, 타인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그 보상적 자극에 기꺼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잔소리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칭찬을 들으시면 좀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소리 하는 것도 다 나쁜 습관(*)입니다.
물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고, 현재의 낮은 자존감에 기반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도 보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니, 입에 발린 소리니, 하지 말고 그냥 즐겨요.
당신의 뇌도 어릴 때에는 그걸 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긍정적 피드백의 뇌의 배선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즐기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네~ 알아요~” 하고 넘기는 연습이라도 이 악물고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자꾸 정색하면서 아니에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음번 칭찬할 일에 자꾸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생각하겠죠. 왜 아무도 칭찬을 하지 않지?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이번엔 정말 잘 했을 수도 있잖아요. 뇌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맙시다.
<불안과 완벽주의>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자기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신호의 간극과 오류들에 예민해진 뇌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가야 할 길이 있잖아. 아직 멀었잖아. 나는 아직도 미련하고 멍청하잖아. 하며) 결국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 실제로 우리의 가치를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섭니다.
(*) 자꾸 겸손을 '떠는' 사람들 중에 자기애가 굉장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 박사 지도교수님께서 일찍이, “겸손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의 겸손은 건방이다”라고 하셨지요.
별 것도 아닌 일을 해 놓고, ‘내가 이렇게나 큰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지 않지?’ 하는 과도한 자기애를 드러내면 너무 위험하니, 이를 반대로 표현하는 반동 형성(reaction formation)이란 방어기제에서 나온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도 될 만큼 뭔가를 진짜 하고 나서 그때 겸손해지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사소한 성취에 대한 사소한 칭찬들을, 그냥 받아들입시다.
저자 약력_ 허지원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젊은연구자상 수상
한국임상심리학회 특임이사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홍보이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CBT기반 어플- 마성의 토닥토닥" 연구 책임자
한국연구재단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정서조절 인공지능 모델 개발 II" 연구 책임자
*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해당 글들을 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저자 : 허지원)
-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이 무너진 마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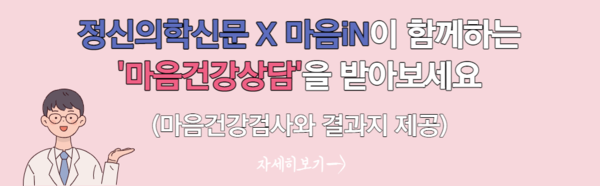
역시나 자존감 관련한 문제에도 "완벽한 존재"를 쫓는것이 문제 중 하나라는걸 볼수 있었네요.
사람은 행복해지기위해 자꾸 완벽해지고 성공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걸 쫓다보면 거꾸로 불행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