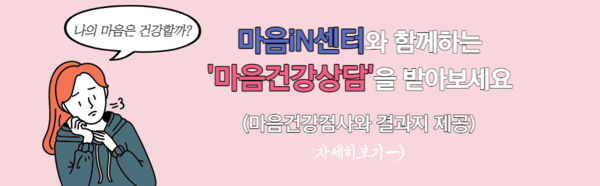30화 제주와 동백
제주 사람을 제외한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러하듯 제주도는 한국에서 특수한 지역으로 쳐진다. 육지陸地 land에서 보기에는 꽤 커다란 섬이고, 말투도 꽤나 낯설다. 내륙 여행의 기반이 거의 마련되지 않던 시대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행=제주’와 같은 생각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제주 본토 사람들이 보이는 첫인상은 영 거칠다. 여행자의 들뜸과 상대방의 태도의 온도차가 불러오는 차이가 정을 붙이기엔 어렵기만 하다. 반대로 제주에서 보기엔 육지 사람들이 낯설다. 제주는 섬 모든 곳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꼴도 별로다. 자꾸 개인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도 마뜩잖다. 이들은 즐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여기저기에 버리고 간 염치와 바꾼 쓰레기들은 억울하게도 도민들이 치워야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동백冬柏은 겨울이다. 이름 그대로 11월부터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핀다. 겨우내 두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사업으로 확장시켜 동백 군락지를 만들어 관광지로 활용하는 사업가도 있다. 첫 방문 때는 나무가 작고 꽃망울도 작아서, 꽤나 아기자기했다. 요즘처럼 피켓이나 리본 등으로 장식되어 있지도 않아서 따로 포토스팟Photo spot이랄게 없었다. 반쯤은 허무함으로 구경했던 곳이 해가 갈수록 나무들은 성장하고, 동백 꽃망울이 커져가는 게 내 눈에도 확연히 보였다.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얼기설기 높은 담처럼 긴 길을 감싸고돈다. 꽤나 오랜 기간 그곳 동백나무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 꽤나 비싼 입장료를 감수하고 종종 들르곤 한다.


그 언젠가의 제주 방문 때 밥을 잘 먹고, 일행에게 소화도 할 겸 근처 어딘가를 구경하자고 꼬드겼다. 그때 순간 골목길 안의 흰 강아지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강아지라면 사족을 못쓰는 나와 일행은 홀린 듯이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흰 강아지의 정체는 진돗개로 추측되는 새끼 강아지였고, 어떤 이유에서 인지 집 근처에 묶여 있었다. 안쓰러움을 뒤로한 채 고개를 들어보니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그 겨울 찾아간 제주는, 작은 골목에서도 동백나무를 볼 수 있었다. 가만히 둘러보니 집마다 담장을 넘는 동백나무를 하나씩 키우고 있었다. 우습게도 제주도민들에게 ‘너희 집에 귤나무 있지?’할 게 아니었다(물론 그들은 주변 어디에서라도 귤나무를 키우고 있지만). ‘너희 집에 동백나무 있어?’하고 물을 일이었다.
특별한 마음으로 나도 동백 한 그루를 들였다가 금세 보내고 말았다. 꽃 몇 망울도 보지 못하고 말이다. 아쉬웠지만, ‘아직 식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먼 훗날을 기약하기로 한다. 예상컨대 완전한 노지에서 키워야 하는 식물일 것이다. 나만의 동백을 갖게 되는 그날, 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숲 하나는, 찾는 이들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숲 일부분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 나무를 제거해야 했다.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럼에도 제주는 그래 왔듯이 언제까지나 그곳에 있을 테고, 나는 한적해질 때를 다시 기다리면 된다. 내가 겨울에 냉면집을 찾아다니듯 말이다.

내게 수많은 휴식과 위로를 보내주던 제주의 숲과 오름처럼,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자니, 10초도 버티지 못하게 머리칼을 완전히 엉키게 하는 바람의 바닷가까지. 제주는 온전한 휴식이자, 기쁨이고, 추억이다. 수많은 약이 나를 온전히 살게 만들어줘도, 본바탕인 나의 정신이 온전한 바탕이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울고 싶으면 울면 된다. 울음을 참으면 안 된다. 영 곤란한 곳을 제외하고는 편안한 공간에서 울고, 쉬길 바란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던 공간을 떠올려보자. 남들은 매일 지나치지만 눈치채지 못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찾아가기 힘든 공간일 수도 있다. 그 공간에서의 오롯한 나 자신을 기억하자.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제주에서 살아가는 날을 꿈 꾸며, 아직 도시를 맴도는 도시 토박이인 나를 위로한다. 또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내게 평온을 주는 공간이 아주 멀리 있지 않음에 안도한다.
* 매주 2회 수, 금요일 글이 올라옵니다.